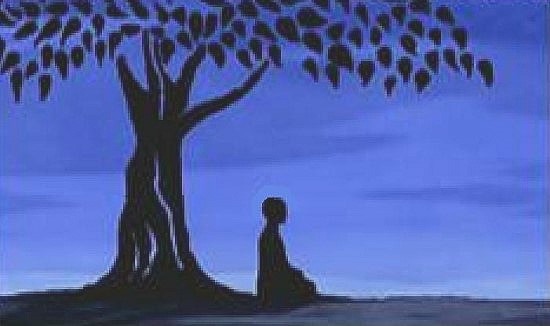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7. 12. 4. 12:11ㆍ성인들 가르침/종범스님법문
마음공부에 아주 중요한 문이 있는데 섭심내조(攝心內照), 마음을 거둬들여서 안으로 보아 진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구(參究)입니다. 그런데 참구가 잘 안되는 것은 바깥 사물에 계속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깥 사물을 좇아가 보면 허망합니다. 색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데, 그것이 공한 줄을 모릅니다.
아마 평생을 만져도 공한 줄을 모를 겁니다. 또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공한 줄을 모릅니다.
참구는 색이 공하고 생각이 공하니까 생각에도 따라가지 말고 바깥 세상에도 따라가지 말고,
오로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됩니다.
색이 공한데 색에 따라가고, 생각이 공한데 생각에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밖의 사물들은 살피기는 하되 따라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살피기는 살피되, 거기에 집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 알고 느끼기는 하되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이 마음공부의 핵심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든 밖의 것이 보이든, 가고 오고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움직이고 꿈꾸고 하는 이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니, '이것이 무엇인가?'하십시오.
앉아 있는 놈이나 듣는 놈이나 가는 놈이나 오는 놈이나 각자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잠자는 놈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워 자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이 이것 하나입니다.
항상 '이것이 무엇인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찻잔을 보며 '이것이 무엇인가?'하는데, 이런 것은 경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바깥 사물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마음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찻잔이라고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참구하는 것입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일도 하고 화도 내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이런 마음공부를 거각(擧覺)한다고 합니다.
'거(擧)'는 '중요한 물건을 선반 위에 얹는다'라고 조선시대에 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내다 버리지 않고, 아무 데나 처박아 놓지 않고, 행주좌와(行住坐臥) 견문각지(見聞覺知) 일용동정(日用動靜)간에 항상'이것이 무엇인가?'를 일상생활 꼭대기에 얹어놓아야 합니다.
물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도 달빛이 그 물에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 속에 항상 높히 얹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각(覺)'은 참구인데, 조선시대에는 '찾을 시(視)'라고 설명했습니다. 얹어만 놓으면 안되고 찾아야 합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마음공부는 찾는 공부이지, 보기만 하고 멈추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야 보리도(菩提道)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구하지 않으면 보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멈추면 번뇌장을 끊어서 적멸까지는 가는데, 보리도는 안됩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 반야지혜를 실천해서 보리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삼세제불(三世諸佛)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아뇩자랴삼먁삼보리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항상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참구하려면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 속에 늘 얹혀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시(提撕)', 잡아 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잡아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 잘하나, 못하나? ' 이런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딸려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內念)이 발동하는 것인데, 여기에 끌려가면 안됩니다.
또 외부 환경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부 공(空)뿐입니다. 공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상(外相)이나 내념(內念)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잡들이고, 마음에 얹어서 깊히 찾으면 일체 생사가 거기서 멈춥니다. 번뇌가 멈추고, 소지장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리하면 생멸신 그대로 무형신을 증득합니다.
마음 공부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인도에 환생하고 천도에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몸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인간과 천상길을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인간 몸으로 이 생사를 멈추게 하고 열반을 얻고 적멸락을 얻습니다.
보리과를 증득해서 극락세계를 눈앞에 체험하고, 대광명을 얻어서 어둠이 없는 세계에 자유자재하는 일체 지위없는 참사람 요사범부가 됩니다.
옛날에는 빨리 죽어서 도를 못닦았는데, 요즘은 백세시대니까 도를 닦을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 말로 도풍(道風)이 일어날 때입니다.
도는 죽기 직전에도 닦을 수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도 도를 닦을 수 있습니다.
할 마음이 없어서 못 닦지, 힘들어서 못 닦는 일은 없습니다.
장수시대일수록 도 닦기 참 좋습니다.
쓸데없는 일하면서 남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도 공부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범스님 법문집 '오직 한 생각'에서 발췌함-
'성인들 가르침 > 종범스님법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노병사(生老病死)가 그대로 생사해탈(生死解脫)이다(2) (0) | 2017.12.19 |
|---|---|
| 생노병사(生老病死)가 그대로 생사해탈(生死解脫)이다(1) (0) | 2017.12.18 |
| 인생 오솔길, 마음을 보는 길 (0) | 2017.11.24 |
| 인생오솔길 (0) | 2017.11.19 |
| 마음 공부의 요점 (0) | 2017.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