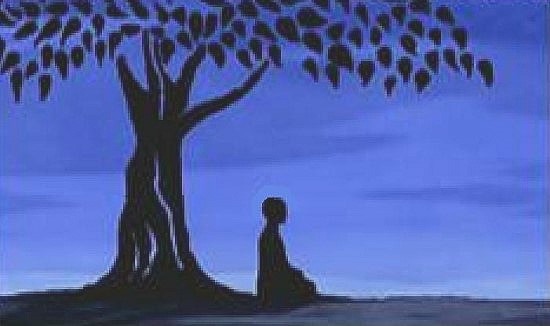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21. 3. 25. 22:32ㆍ성인들 가르침/라마나 마하리쉬
질문 : 구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 '실제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파괴적인 생각이 구속의 본질이다.
그러나 아무도 실재에서 분리된 상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물리치도록 하라.
질문 : 내가 곧 참자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하리쉬 : 사람들은 자기가 참자아라는 사실을 기억해 냈다느니 망각했다느니 하고 말한다.
그러나 기억과 망각은 생각이 있는 동안에만 나타나는 서로 다른 사고의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실재는 기억과 망각을 초월해 있다.
기억과 망각은 기억하거나 잃어버리는 주체로서의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참자아는 기억과 망각의 주체가 아니다.
만약 참자아가 주체라면 망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억과 망각의 주체는 개체적인 자아로서의 '나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개체적인 자아로서의 '나'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체적인 자아로서의 '나'라는 말은 무지(無知)나 환영(幻影)의 동의어이다.
모든 영적인 가르침의 목적은, 무지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누군가에게 무지가 있으려면, 그 누군가는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앎과 알지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깨어있음'이 곧 진정한 앎이다.
그러므로 무지는 없는 것이다.
진정한 앎은 영원하고 본래적이다.
하지만 무지는 비본래적이며 비실재이다.
질문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만족스러운 상태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 습(習,삼스카라, 과거로부터 쌓아온 정신적인 傾向性)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스카라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의심과 혼란이 있게 마련이다.
의심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애쓰지만, 그 뿌리를 잘라내기 전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의심과 혼란의 뿌리가 바로 삼스카라이다.
삼스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제자의 삼스카라를 제거함에 있어서, 스승은 제자 스스로 무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삼스카라는 없애는 첫번째 단계는 진리를 듣는 것이다. 진리를 듣고도 확실히 이해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비추어 보기와 집중으로 내면을 응시하는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단 한 번 진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을 얻는 진화된 구도자들도 간혹 있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질문 : 무지(無知)가 생기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마하리쉬 : 무지는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 무지는 실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재하는 것은 오로지 앎 뿐이다.
질문 : 그런데 저는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하리쉬 : 삼스카라 때문이다. 누가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무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다.
질문 : 그렇다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군요.
마하리쉬 :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도달하고 나면 끝나 버리기 때문이다.
항상 있는 것이라야 진정한 목표라 할 수 있다. 목표에 도달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에고다.
그러나 목표는 에고보다 앞서 존재한다. 목표는 그대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시 말해 에고가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한다. 그대가 생각하는 '나'는 에고가 나타나면서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기를 에고와 동일시하면 에고가 자기인 것 같고, 마음과 동일시하면 마음이 자기인 것 같다.
또 육체와 동일시하면 육체가 곧 자기인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기에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 생각의 특징이다.
흐르는 물 속에 비친 그림자는 흔들린다. 물 속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흔들림을 멈추게 하려면 물이 아니라 빛에 주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에고와 에고의 활동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빛에 주목하라.
'나라는 생각'이 에고이다. 참자아만이 진정한 '나'이다.
질문 :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하리쉬 : 깨달음은 이미 거기에 있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만이 유일한 실재이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깨달을 것이 없다. 자신의 참자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 보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깨달음이란 말은 깨닫는 자아와 깨달아지는 참자아라는 두 개의 자아를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어찌 참자아를 알지 못하겠는가?
질문자 : 생각과 마음 때문이지요.
마하리쉬 : 그렇다. 마음이 행복 앞에 장막을 드리운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가?
만약 주변에 있는 현상세계를 봄으로써 그것을 보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면, 깊히 잠들었을 때는 어떻데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
질문 : 어떻게 해야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마하리쉬 :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음 아닌가? 어떻게 마음이 마음을 없앨 수 있겠는가?
마음으로는 마음을 없앨 수 없다. 마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도록 하라. 그러면 마음이라 것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리라. 참자아의 자리에 들어가면 마음은 사라진다.
따라서 참자아 안에 거하면 마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질문 : 묵티(해탈,자유)와 깨달음은 같은 것입니까?
마하리지 : 묵티는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갈망하는 것은 매우 우수꽝스러운 짓이다. 시원한 그늘에 앉아 있던 사람이 제 발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양지로 걸어나가 더워서 못살겠다고 투덜거린다. 그는 그늘을 찾아 여기 저기 헤메다가, 적당한 그늘을 만나면 '아! 정말 시원하구나, 이렇게 시원한 그늘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던가!' 하며 즐거워한다. 원래 그늘 밑에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자유를 찾아 여기 저기 헤매는 그대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 우리는 실재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함으로써, 분리를 극복하고 실재와 하나되기 위해 맹렬한 영적인 수행을 한다. 있지도 않은 분리감을 상상으로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 깨달음은 오직 스승의 은총에서 비롯되며, 스승의 발밑에 엎드릴 때에야 지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리쉬 : 무엇이 지복인가? 그대의 존재 자체가 지복 아닌가? 존재와 지복은 같은 것이며, 그대가 곧 그것이다. 그대는 지금, 덧없이 변화하는 마음이나 육체를 그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그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질문자 : 저는 어둡고 무지합니다.
마하리쉬 : 그 무지가 사라져야 한다. '나는 무지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 무지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그대의 참자아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참자아가 바로 그대이다. 소크라데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런 것이 무지인가? 아니다. 소크라데스의 말은 진정한 앎에서 비롯된 것이다.
-디이비드 갓맨 편집, 정창영 옮김 <있는 그대로>-

'성인들 가르침 > 라마나 마하리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아 탐구 실제 수행방법 및 이론 정리 (34) (0) | 2021.04.15 |
|---|---|
| 자아 탐구 실제 수행방법 및 이론 정리 (33) (0) | 2021.04.06 |
| 자아 탐구 실제 수행방법 및 이론 정리 (31) (0) | 2021.03.16 |
| 자아 탐구 실제 수행방법 및 이론 정리 (30) (0) | 2021.03.04 |
| 자아 탐구 실제 수행방법 및 이론 정리 (29) (0)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