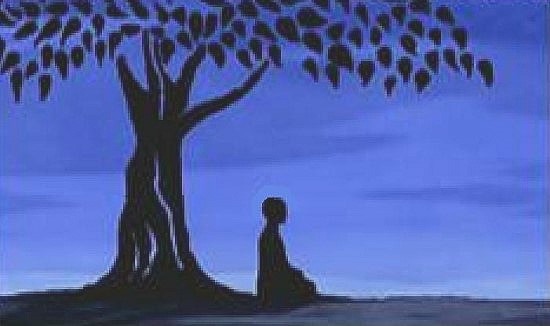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9. 9. 20. 09:54ㆍ성인들 가르침/초기선종법문
[본문]
경에 설하길,
"법신불(法身佛)에 의해 수도한다면 중생을 교화함을 짓는 것이 없고, 중생을 실(實)하게 함을 짓는 것도 없다"고 하였다. 이 까닭에 법계는 평등하여 득실(得失)이 없다.
만약 법신불에 의거하여 수도한다면 열반을 구함이 없다. 왜 그러한가.
법(一切法, 모든 것)이 열반인데 어찌 열반으로 열반을 구하겠는가.
정심(正心)하고자 하는 때는 일체법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일체법을 구하지도 말라.
법신불에 의거하여 수도(修道)하는 자는 마음을 돌(石)과 같이 하여 묵묵히 각지(覺知)함 없고 분별함도 없으며, 일체에 등등(騰騰)하게(활기차게) 하되 마치 바보처럼 하라 !
왜 그러한가. 법(수상행식의 오온,존재)은 각지(覺知)함이 없는 까닭이다.
법은 능히 나에게 두려움 없다는 것을 주는 까닭이다. 이것이 크나큰 안온처이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사죄(死罪)를 범하여 반드시 참수향을 받아야 할 것인데,
마치 왕을 만나 석방되어 바로 죽는 걱정이 없게 된 것과 같다.
중생도 또한 이와 같다.
십악(十惡), 오역죄(五逆罪)를 짓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것이나 법왕(法王)이 대적멸(대열반: 대열반의 광명)을 발하여 사면해 주니 바로 모든 죄가 면해지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왕과 친한 벗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남녀를 죽이게 되었고 잡혀서는 곧 앙갚음을 당하게 되어 이 사람이 의지할 바없이 황망히 두려워하다가 홀연 대왕을 만나게 되어 바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사람이 파계하여 살계(殺戒)를 범하고, 음계(淫戒)를 범하며, 도계(盜戒)를 범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다가 스스로 (자심에서) 자신의 법왕을 보고 (자심에서 불성을 깨닫고)는 바로 해탈하는 것이다.
[해설]
<1>
여기서는 법신불에 의해 수도할 것을 설하였다. 달마대사 이래 <능가경>에 의해 수도하고 심인상전(心印相傳)하였는데, <능가경>에 법신불과 보신불, 화신불의 차이에 관한 법문이 여러 곳에 나온다. 그 일부를 아래에 인용한다.
권6 게송품에,
모든 불자에게 설한 것과(所有佛子說)
모든 부처님의 설은,(及諸導師說)
모두 화신불의 설이지(悉是化身說)
진실불(法身佛)과 보신불의 설이 아니니라.(非是實報佛)
고 하였다. 또 권3 집일체법품에
대혜여 ! 모든 존재의 자상(自相), 공상(共相)은 화신불(化身佛)의 설이고,
법신불(法身佛)의 설이 아니니라.
대혜여 ! 화신불의 설법은 단지 어리석은 범부가 일으키는 생각에 다른 것이니,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와 삼매락(三昧樂)의 경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이니라.
권6 변화품에
대혜여 ! 변화여래(化身佛)는 금강역사(金剛力士)가 항상 따르고 호위하며 진신불(眞實佛)이 아니나니, 진실여래는 모든 근량(根量: 인식기관에 의지하여 사량분별함)을 떠나 있어 2승(2,3승) 외도가 능히 알 수 없느니라.
(진실불(眞實佛)은) 현전의 법락(法樂)에 머물러 지인(智忍: 결정의 지혜에 不動하여 안주함)을 성취한 까닭에 금강역사의 호위를 빌리지 않느니라. 일체의 모든 화신불(化身佛)은 업에 따라 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화신불인 까닭) 불(佛)이 아니며, 또한 불(佛)이 아니지도 않느니라.
비유컨대 도공(陶工)이 여러 가지 것을 화합하여 만든 것이 있는 것과 같이, 화신불도 역시 이와 같아, 여러 상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나, 자증성지(自證聖智)로 행해지는 경계를 설할 수 없느니라.
요컨대 화신불은 중생의 분별에 따라 설한 것이지만 법신불은 자심에서 증득한 성지(聖智; 自證聖智)로 행해지는 경계로서 상을 떠난 자리인 까닭에 언설로 설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자증성지(自證聖智)는 <능가경>에 자주 나오는 핵심요의이며, <능가경>의 선지(禪旨)가 된다.
능가경의 가르침은 자상(自相)과 공상(共相)의 모든 상을 바로 넘어 선 자리에서 행하는 선지를 드러내고 있다.
즉 법신불에 직통하는 길이 뚜렷해지니 본지풍광(本地風光)이 열린다.
<2>
이 마음이 그대로 법계이고 진리인데 무엇으로 무엇을 구한다 함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3>
'마음을 돌과 같이 하라' 함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심성이 본래 그러한 까닭이다.
<대반야바라밀다경> 권286 <초분찬청정품>35-2에.
"일체법이 본성이 둔(屯)한 까닭이니, 이와 같이 청정한 본성은 지(知)함이 없는 것이니라"고 하였다.
본성이 본래 지(知)함이 없고 견(見)함 없으며, 분별함이 없다. 그래서 돌과 같고, 둔하다 하였다.
그래서 일체법에 묵묵히 바보같이 있으라고 하였다.
여기서 "등등(騰騰)"이라 한 것은 그렇게 묵묵히 바보같이 있되, 활기차게 하라는 말이다.
묵묵히 바보같이 있으려고 해도 이제까지의 습력(習力)으로 인해 좀 되다가도 곧장 흐트러져 버리고 지해(知解)가 쏜살같이 왕래한다. 그러한 습력의 파도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묵묵히 바보같은 행을 활기차게(騰騰하게) 해야 한다. 묵묵히 바보같은 행은 바로 '아무 데도 없는 마음'의 뜻이 구현되는 행이다
묵묵히 바보같은 행은 "응무소주(應無所住: 아무 데도 머무름 없음)"의 행이고.
"등등하게"의 행은 "이생기심(而生其心 : 그 마음을 내라)"의 행이다.
"그 마음을 내라"고 했다 하여 머리를 굴려 지해(知解)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아무 데도 없는 마음'의 뜻이 자연히 무위(無爲)로 상응되어 오는 행이다.
이러한 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바탕에 "아무데도 머무름 없음(應無所住)"의 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또한 "아무데도 머무름 없음"의 행은 그 바탕에 마음이 본래 지(知)함이 없고, 견(見)함이 없으며, 분별함이 없다는 뜻이 구현되고 있다.
<4>
<능가경>에 자주 나오는 명구(名句) 가운데 "자각성지(自覺聖智)", "자득성지(自得聖智)"가 있다.
"자심(自心)에서 깨달은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라는 뜻이다.
본래 자심에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덕성이 평등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었어도 자심에서 자심이 해탈되어 있음을 알면 해탈하게 된다.
자심에 즉(卽)하여 불(佛)임을 알면 바로 즉심시불(卽心是佛)이다.
-담림 편집,박건주 역주 <보리달마론>-
'성인들 가르침 > 초기선종법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떤 것이 날카로운 근기이며, 어떤 것이 둔한 근기입니까? (0) | 2019.11.22 |
|---|---|
|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0) | 2019.10.26 |
| 즉입(卽入)의 가르침(2) (0) | 2019.09.09 |
|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함(空寂)"을 아는 것이 도(道)를 닦는 요체(要諦)이다. (0) | 2019.06.10 |
| 마음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일어난 곳을 살펴라 (0) | 2019.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