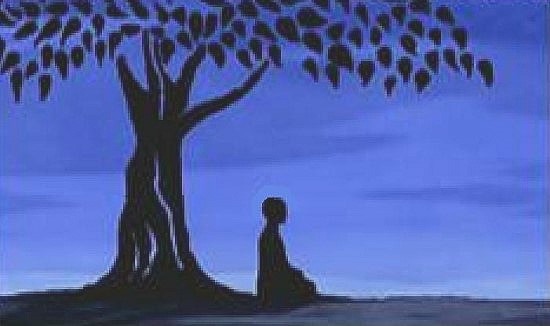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5. 11. 4. 10:33ㆍ성인들 가르침/라마나 마하리쉬
방문자 : 어떻게 하면 마음을 올바른 길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마하리쉬 : 수행을 하면 됩니다. 마음에게 좋은 생각들을 안겨주십시오. 마음을 좋은 길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방문자 : 그러나 그것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마하리쉬 :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점차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마음을 진아 안에 고정하라' '수행과 무욕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수행이 필요하지요. 진보는 느리겠지만.
방문자 : '진아 안에 고정하라'할 때에 그 진아가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 그대가 자기(진아)를 모릅니까? 그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면 그대의 존재성을 부인합니까? 그대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이 진아는 누구지?'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질문은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대가 누구인지 알아내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방문자 : 저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진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하리쉬 : 진아는 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으면 유식해집니다. 그것이 책을 읽는 목적이고, (읽으면) 그것이 성취됩니다.
방문자 : 아뜨마 사끄샤뜨까라(진아직각(直覺)-진아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 그대는 아뜨마(진아)이고, 그 사끄샤뜨(지금,여기)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까라(성취)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 그대가 자신을 비진아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그대는 두 개의 자기가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 질문의 근저에는 그대가 자신을 그 거친 몸과 동일시함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질문은 지금 일어납니다. 그대가 잠 들어 있을 때도 그런 질문이 일어났습니까? 그대는 그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잠 속에서도 존재했지요.
이 두 상태 간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지금은 그 질문이 일어나는데 잠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는 자신이 그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주위의 사물을 둘러보면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아를 (대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습(習)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감각기관들은 지각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바로 '보는 자'입니다. 그 보는 자로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달리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잠이 들었을 때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뜨마 사끄샤뜨까라(진아 깨달음)는 아나뜨마 니라사나(비아의 포기)일 뿐입니다.
방문자 : 단 하나의 자아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자아들이 있습니까?
마하리쉬 : 이 역시 혼돈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대는 몸을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그대는 "여기 내가 있다. 여기 그가 있다. 남이 있다. 뭐가 있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수의 육신들을 보면서 그 만큼 많은 자아들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대가 잠들었을 때도 "나는 여기서 자고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지?"하고 물었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 무슨 질문을 하기라도 했습니까? 왜 질문이 일어나지 읺았습니까? 그것은 그대가 오직 하나이지 여럿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문자 : 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마하리쉬 : 그대 자신이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리를 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와 별개로 그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대로 하여금 그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그대의 본질적 성품으로 머무르십시오. 모든 경전들은 그대에게 비진리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해줄 뿐입니다. 비진리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리가 항상 순수하고 단순하게 빛납니다.
방문자 : 저의 진리와 저의 임무를 알고 싶습니다.
마하리쉬 : 먼저 그대의 진리를 아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대의 임무가 무엇인지 물어도 됩니다. 임무를 알고 그것을 행하려면 그대가 존재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고 나서 임무에 대해 물으십시오. (153)
-라마나 마하리쉬 대담록-
[한담(閑談)]
마하리쉬님은 '진리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곧 잘 <깊은 잠>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깨어있는 상태에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생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수행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깨어 있는 생시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항상 이원적인 대상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원적인 대상화 상태란 주관 과 객관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시상태에서 보는 자와 보는 대상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는 보통 보는 자를 한 개인의 육체라고 여기고 보여지는 대상은 육체 밖에 있는 다른 사람, 사물,세상 등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때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육체라고 동일시하여, 육체를 가진 개인인 '나'가 보는 주체가 되고, 나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감각기관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나와는 다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의 이원적인 분별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적인 분별마음상태는 우리 자신이 육체를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하므로써 생긴 잘못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원적 분별마음상태는 깨달음의 시각에서 보면 거꾸로 전도된, 잘못된 망상(妄想)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된 마음 상태를 올바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진리를 깨치는 것, 우리 자신의 올바른 진아를 아는 것, 즉 진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뒤집혀서 거꾸로 보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관점을 어떻게 되돌려 놓는가? 이것이 우리가 당장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나라고 여기고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좀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사실 우리는 직접 육체를 느끼고 희로애락를 느끼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나 세상 뿐만 아니라, 우리자신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나의 대상들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몸과 마음이 대상인데도 우리는 그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나라고 하면 주체가 되어야지,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알았는데도, 여전히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는 습(習)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알았는데도 우리의 육체 동일시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더 깊히 들어가 봅시다. 몸과 마음이 알려지는 대상이므로, 그러면 그것들을 아는 주체인 '나"는 무엇인가? 사실 몸과 마음이 자기라는 생각은 생시상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침 잠에서 깨기 전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었으므로,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생각들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야 "나"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이어서 몸이라는 느낌과 생각의 움직임, 눈을 뜨면서 방안에 벽이나 천장, 장농이나 책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밖의 대상을 보기 이전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순수하게 '나' 또는 "내가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잠깐 있습니다. 이때는 깨어나면서 --> 나라는 느낌이 나타나고 이어서 --> 대상을 보게되는 순서로 깨어남이 진행되는데, 처음 나라는 느낌이 나타나는 순간, 이때는 대상이 전혀 없는 보는 자만 있는 상태인데, 이때를 순수한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잘 감지되지는 못하지만, 오랫동안 수행한 구도자들은 이러한 순간을 잘 캐취합니다. 이 순수하게 깨어있는 순간을 니사르가다타 마하리지는 "내가 있다"앎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느낌은 깊은 잠과 생시상태의 중간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은 깊은 잠과 생시상태의 넘어에 있으면서 잠과 깨어있음의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짧은 간격에 잠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잠과 깨어있음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는 존재앎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깨어남과 잠을 중간 상태처럼 여겨집니다. 이 상태는 수행중의 깊은 삼매상태와 같습니다.
수행중에 이러한 잠과 깨어있음의 중간 상태와 비슷한 삼매상태를 오랫동안 체험하면, 이 상태에서 이원적인 분별마음의 습(習)을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수행을 방해하는 초상능력 등, 마구니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상태를 겪지 않고 육체 동일시된 상태에서 바로 절대 진아로 즉각 넘어간다는 예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 상태를 소위 의식과 동일시된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우주적 자아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상태가 "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나"가 우주적으로 넓게 확장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높은 근기의 구도자라는 것은 바로 이 "내가 있다"는 상태에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이 "내가 있다"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으면, 이때는 무슨 수행을 한다거나 경전을 본다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스승이든지 이 상태에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가 있다"는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불철주야로 한시도 쉴틈없이 열렬하게 피땀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 "내가 있다"가 절대진아는 아닙니다. 위에서 라마나 마하리쉬가 말한 '진아'는 "내가 있다"가 "내가 있다" 속으로 합일하여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를 마하리쉬는 "깊은 잠"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는 완전한 비이원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이들은 깊은 잠과 같은 절대진아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있다"는 앎에도 한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진아 삼매 속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사람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잘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언행은 무위적(無爲的)인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요즘 테레비죤에서 다섯살 이하 어린이들의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한 귀염둥이 언행을 관찰하면서 즐기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의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한 행동처럼 자기 자신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행동과 같은 모양을 무위적인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이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무지하지 않고도 그러한 자연스런 무위적 언행을 한다는 것이죠.
마하리쉬가 진아상태가 깊은 잠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만 생시상태와 비교해서 상대성 분별심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 것일 뿐이지, 깊은 잠의 상태는 실질적으로는 무지상태입니다. 그러나 진아상태는 전체적으로 대상이 없는 잠상태와 같으면서도 밝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태양에서 직접 나온 빛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두운데, 오히려 지구나 달에 반사된 빛이 더 밝게 보이는 물리적 현상은 우리 인간의 의식작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진아에서 직접 나온 순수의식의 빛은 무지와 같이 모르는 것이고, 오히려 육체에고에 반사되어 나온 분별앎은 명확해 알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한담에는 이야기가 별로 두서가 없이 쓰여진 것 같네요. 그렇지만 나오는 대로 무위적으로 줄줄 써내려 간 글이라 이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잠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글이 싱겁다고 한담(閑談)입니다. ㅎ ㅎ ^^*
-무한진인-
'성인들 가르침 > 라마나 마하리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아는 (대상을) 보는 자가 아니다. (0) | 2015.11.22 |
|---|---|
| 신에게 완전히 순복하면 지복이 나타난다. (0) | 2015.11.15 |
| "내가 있다"앎은 무형상이고, 전체에 펼쳐져 있는 우주의식이다. (0) | 2015.10.26 |
| 생각들의 뿌리를 생각하라 (0) | 2015.10.21 |
| 그대가 그것이다(2) (0) | 201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