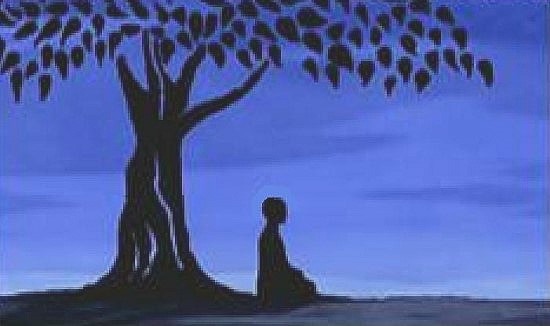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1. 9. 22. 19:41ㆍ성인들 가르침/노자도덕경
[무한진인의 노자도덕경 해설 64회]
[한문원문]-백서본,곽점본
其安也 易持也 其未兆也 易謨也
기안야 이지야 기미조야 이모야
其脆也 易判也 其幾(微)也 易散也
기취야 이판야 기기(미)야 이산야
爲之於其未有
위지어기무유
治之於其未亂也
치지어기미난야
合抱之木 作於毫末
합포지목 작어호말
九成之臺 作於(卄累)土
구성지대 작어 루토
百仞之高 始於足下
백인지고 시어족하
------------------------------------------------
爲之者敗之
위지자패지
執之者遠(失)也
집지자원(실)야
是以聖人無爲也 故無敗也
시이성인무위야 고무패야
無執也 故無失也
무집야 고무실야
民之從事也 恒於其成事而敗之
민지종사야 항어기성사이패지
故愼終若始
고신종약시
則無敗事矣
칙무패사의
是以聖人欲不欲
시이성인욕불욕
而不貴難得之貨
이불귀난득지화
敎不敎(學不學) 而復衆人之所過
교불교(학불학) 이복중인지소과
是故聖人能輔萬物之自然
시고성인능보만물지자연
而不能(敢)爲
이불능(감)위
[한글해석]
마음이 안정되어,
평온함이 유지되면,
생각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에
(무심의) 평온함이 꾀해져야 하는 것이오.
마음이 가볍게 들떠서
평온함이 갈라지게 되면
생각이 미세하게 일어나므로
(무심의) 평온함이 흩터져 버리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수행은 생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부터 해야하고.
마음의 다스림은 생각이 아직 어지럽게 움직이기 이전에 해야하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같은 새싹부터 일어나고
아홉층 누대도 한 삼태기 흙에서부터 지어지며
백길 높은 곳도 발 밑의 땅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외다.
---------------------------------------------------
(도를 위해)억지로 수행하려는 자는 실패하게 되고
(도를)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자는 도와 더 멀어지게 되오.
성인은 억지로 행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도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놓치지도 않소.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항상 거의 다 성취한 상태에서 실패를 하오.
따라서 처음 시도할 때처럼 마지막도 조심하게 되면
곧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외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욕을 바라므로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가르침 아닌 가르침으로 (말없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지나쳐 버리는 자기 허물을 돌이켜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외다.
이렇게 성인은 만물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 되도록 도와줄수 있을 뿐이며,
억지로 의지를 내세워서 행하려고 하지는 않소이다.
[해 설]
이번 왕필본의 64장은 백서본에서는 27장에 해당합니다.
내용이 다른 상,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곽점본에서는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백서본에서 엮을 때에 한장으로 묶은 것 같읍니다.
상부 문단의 내용은,
아직 유위행의 수행을 하는 수행자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것 같으며,
마음이 안정되면 평온함이 유지되어, 이 생각없는 상태에서 평온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읍니다.
즉 생각이 나오기 이전에 머무르고, 그 생각이 없는 무심상태를 유지하는 수행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하부 문단의 내용은,
최종 절대바탕의 도에 근접한 상근기 구도자에게 일러주는 내용으로써, 도를 구하려고 의도적인 수행을 하면 도를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즉 의도적인 수행 행위를 그치고, 나를 버린 자연스러운 무위행으로써 도에 다가가라고 충고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에 모든 지식과 수행마저 버려야만 도에 진입할 수가 있다고 일러주고 있읍니다.
이번 해석에서도 기존의 해석서들과 좀 차별나게 해석된 부분이 다소 있읍니다.
맨 첫문단에서 기존의 해석서들은 <易>자를 "쉽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읍니다만,
여기서는 <易>자를 "평온함"으로 해석을 했읍니다.
따라서 이 <易>자가 나오는 첫 문단은 기존 해석서들의 해석내용과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 다른 문장에서는 크게 차별나게 해석한 부분이 없는것 같읍니다.
其安也 易持也(기안야 이지야) : 마음이 안정되면 평온함이 유지된다.
安; 편안하다,안정되다. 易; 평온하다,쉽다,바뀌다. 持;지니다,버티다,유지하다,보존되다.가지다.
其安也 ; 그것(마음)이 안정되면,
易持也 : 평온함이 유지된다.
<其>는 "마음" 또는 "생각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易>는 거의 모든 도덕경의 해설서들이 "쉽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易>는 "평온하다"는 의미로서 "평온함"이 주격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노자도덕경 해설 및 주석서들은 이 <易>자를 "쉽다"라는 술어의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64장의 전체내용이 첫번째 문단부터 그 뜻이 빗나가 있읍니다.
기본적인 문장으로써 <易持也>는 "평온함이 유지된다"라고 당연히 번역되어야 하는데, 모든 번역서들이 이 문장을 술어로써 해석을 해서 " 유지하기 쉽다" 또는 "쉽게 유지한다"라고 주격을 생략한 번역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易>자를 "~하기 쉽다,쉽게 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은 노자도덕경 왕필본을 비롯한 초기의 주해서들이 모두 <易>를 "쉽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수천년동안 후대사람들은 그것을 아무 검토없이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왕필본은 <其安易持>로 되어 있지만, 해석은 그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평온이 유지된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번역서들이 문장의 주격(主格)를 생략한채, "안정되면 유지하기 쉽다"라고 해석들 하고 있읍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평온이 유지된다>는 말은 "생각의 움직임이 없이 안정되면, 마음이 평온하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움직임이 없다는 상태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無念)의 상태, 즉 자기존재감도 없는 아주 고요한 삼매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깊은 잠과도 같이 자기 자신이 있다는 생각조차 없는 "無心"상태를 말합니다.
其未兆也 易謨也(기미조야 이모야); 생각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평온함이 꾀해져야 한다.
未; 아니다,아직~하지 못하다. 兆;빌미,조짐,시작되다,나타나다. 易 ;평온함. 謨 ; 꾀하다,계획하다,꾸미다, 속이다.
其未兆也 ; 그것(생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또는 생각이 일어날 조짐이 있기전에.
易謨也 : 평온함이 꾸며져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평온함이 꾸며져야 한다'는 것은 최초의 생각이 나오기 이전에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존재느낌이며, 그 존재느낌이 나오기 이전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본래 바탕인 무심상태에 안주할 수가 있읍니다.
그 상태에 안정시키는 것을 보통 일반적인 수행체계에서는 "내면으로 들어가 안정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읍니다.
이 문장도 역시 <易>가 "평온함"이라는 의미의 주격입니다.
따라서 <易謨也>는 "평온함이 꾸며진다"라고 직역하게 되지만, 이말은 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무심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의도적인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의도적인 수행시에도 '나"라는 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평온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謀>로 표현한 것 같읍니다. <謀>자는 꾀하다,도모하다, 계획하다, 등 능동적인 수행행위를 말합니다.
其脆也 易判也(기취야 이판야) ;마음이 가볍게 들뜨면, 평온함이 갈라져 떨어진다.
脆; 연하다,무르다,가볍다,부드럽다. 易; 평온함, 判;갈라지다,나누다,구별하다,떨어지다.흩어지다.
其脆也 ; 마음이 가볍게 들뜨면, 또는 마음의 움직임이 가벼워지면
易判也 ; 평온함이 갈라져 떨어진다.
<脆>는 가볍다,물러지다, 부드러워지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마치 얼음처럼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다가 녹아서 부드러운 유동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判>은 나눠지다, 갈라지다, ,떨어진다,분별하다 등의 뜻이 있으므로 무심상태가 깨진다는 표현입니다.
이 상태는 "나"라는 느낌이 마음 표면에 나타난 직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의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에 의식이 꿈틀거리는 상태로 비유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정신이 막 깨어나면서 깊은 잠의 아무것도 모르는 지복상태가 깨져 버리는 것이죠.
무심상태로부터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온 상태가 대상을 분별하는 상태로 바뀌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한물결도 없는 잔잔한 연못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잔 파도 물결이 생기면 연못물 표면의 고요함이 갈라지는 것처럼 묘사했읍니다.
즉 전체가 일체인 순수한 마음상태에서 나라는 개체의식이 일어나면서 나와 세상을 나누고 분별하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其微(幾)也 易散也(기미야 이산야); 생각의 미세한 일어남으로, 평온함이 흩어져 버린다.
微;작다,정묘하다,미세하다. (幾) : 기미,조짐,(곽점갑본) , 散 ;흩어지다,나누어지다. 섞이다.
其微也 : 생각의 미세한 일어남으로
易散也 : 무심의 평온 함은 흩터져 버린다.
<微>는 미세함, 아주 작은,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생각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 <微>자는 곽점갑본에서는 <幾>자로 되어 있으며 '조짐,기미,낌새'의 뜻이 있으므로 생각이 움직이는 조짐, 낌새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면 마음의 평온이 흩어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나"라는 느낌이 마음 표면에 나타나서 세상을 대상으로서 지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의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자 마자 정신이 들고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로 비유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정신이 막 깨어나면서 깊은 잠의 아무것도 모르는 지복상태가 깨져 버리고, 자기가 작은 육체를 가진 한 사람이라는 개인 동일시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가 하나가 된 평온한 지복상태에서 작고 협소한 개인의식으로 분활되는 것이죠.
위의 네 문단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 해석서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 잠깐 들여다 보겠읍니다.
<易>자를 "쉽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문장의 주격(主格)이 생략되어 있읍니다.
백서본과 왕필본의 두가지 대표적인 해석을 예시해 보겠읍니다.
모든 노자도덕경 해석이 아래 예시된 해석과 거의 비슷합니다.
-백서본 해석 예시-
<안정되었을 때 유지하기 쉽고
드러나지 않을 때에 도모하기 쉬우며
연약할 때에 부수기 쉽고
미세할 때에 흩뜨리기 쉽네>
-왕필본 해석 예시-
<가만히 있을 때에는 쉽게 잡을 수 있고
아직 낌새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꾀하기 쉽고
연한 것은 녹기 쉽고
미약한 것은 흩어지기 쉽다.>
위에 예시한 해석과 같이 모든 해석서들이 <易>를 "쉽다"라고 해석을 했읍니다만,
무엇이? 유지하기 쉽고, 도모하기 쉬우며,부수기 쉽고, 흩으러지기 쉬운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주체가 생략되고 없어서 명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하여, 대략 읽는 사람이 적당히 상상하면서 짐작으로 (그것인가?하고 )때려 잡을 수 밖에 없읍니다.
이와는 달리, 본 해석에서는 앞문장의 <其>는 "마음" 또는 "생각의 움직임" 으로
뒷문장의 <易>는 "평온함"이라는 주격으로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해석을 했읍니다.
爲之於其未有(위지어기무유); 수행은 생각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에 해야 하며.
<爲>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구도 수행'을 말합니다.
<其未有>는 "아직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행은 생각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나"라는 느낌조차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닦는 수행자 지망생들은 이 "아무것도 알수없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구도자라기 보다는 유치원 단계의 예비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적어도 나라는 느낌이 나오는 그 지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유치원 단계를 벗어난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 개인육체와 마음, 현상세계가 무지로부터 비쳐진 환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나오기 이전에 안정되게 머물 수가 있읍니다.
治之於其未亂也(치지어기미난야): (생각의) 다스림은 생각이 아직 어지럽게 움직이지 않을 때에 해야하오.
생각의 다스림이란 쓸데없는 망상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려진 대상과 망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망상과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이끌려 다니게 됩니다.
집착과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망상이 나오기 이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첫생각이 나오기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 망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데,
그 첫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개체적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있다"는 첫생각이 없으면 망상도 나타나지 않읍니다.
생각이 어지럽게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존재의식의 기본 스크린 위에서 비쳐지는 것이므로, "내가 있다"는 생각이전에 머물러 있어야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내면 속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갖 망상의 어지러운 움직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合抱之木 作於毫末(합포지목 작어호말);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같은 싹에서 일어나고
合捕之木; 아름드리 나무. 毫;잔털,터럭,末;끝
크게 성장한 나무도 처음에는 아주 가는 털끝과 같은 어린 싹에서 부터 나오듯이,
이 무한한 우주세계도 "내가 있음"이라는 하나의 존재핵점에서 나옵니다.
九成之臺 作於(卄累)土(구성지대 작어누토); 아홉층 누대도 한삼태기 흙에서부터지어지며
九成之臺; 9층 누대, (卄累) ;삼태기
거대한 높이로 싼 높은 9층 탑도 처음에는 흙 한삽부터 쌓아올렸다는 말이죠.
(卄累)자 "삼태기 누자"로써 컴퓨터에 입력이 안되어 획을 분해해서 타자를 쳤읍니다.
百仞之高 始於足下(백인지고 시어족하);백길 높이도 발바닥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仞; 길이 단위
백길이나 하늘로 뻣친 높은 곳도 처음에는 발바닥 땅밑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의 세가지 문장은,일이 크게 확대되기 이전에 처음의 아주 미세한 때부터 아예 그 싹부터 다루어야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예를 들었읍니다.
이 세상은 의식으로 형성된 거대한 생각의 나무와 같은 것이며, 그 생각의 나무가 나온 뿌리는 바로 존재의식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씨앗에서 실뿌리가 나오기 이전을 깨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 수행은 마음이 나타나기 이전의 무지상태, 즉 나라는 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무심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르는 수행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유위행(有爲行)의 수행에 힘쓰고 있는 기초 수행자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
이번 문장부터는 유위행의 수행을 넘어선 상근기 구도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무위행이며, 절대본체에 안주하기 위한 일종의 최종적인 보림과정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爲之者敗之(위지자패지) ; (도를 위해)억지로 수행 하려고 하는 자는 실패하고
일반적으로 도를 닦는 행위를 수행이라고 하며, 여러가지 명상이나 기도,만트라 또는 요가,단전호흡등 많은 실천 방법이 있읍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방법의 구도수행이 있고, 고금의 많은 도인들이 극기와 고난을 극복하며 자기생명조차 희생시키면서 궁극적인 도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들이 인류의 정신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장에서는 어째서 도를 구하기 위하여 수행을 하면 실패한다고 했을까요?
보통사람이 처음에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전공부와 자기극복을 넘어설 수 있는 무욕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도자가 어느 단계에 까지 도달했는데도 여전히 특정 종교철학이념이나 수행방편에만 의존하여 그 속에서 묶여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 수행과 종교철학개념에 집착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종 깨달음이란 모든 지식과 개념과 모든 속성과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믿고있는 종교철학이념과 수행방편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본래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최종 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문 없는 문, 있는 그대로 무위자연의 길을 걷는 것이죠.
수행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식에서 벗어나 자기가 전체라는 것을 깨치기 위한 것인데,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그 행위자체가 개인의지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수행을 과감하게 버리면, 자연히 개인의식과 욕망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위자"라는, 행위의 주인공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개인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나"가 육체 동일시에서 벗어난 전체 의식이 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자아관념이 없어지고, 전체흐름에 맡겨져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무위적인 자유입니다.
저절로 흘러가는 전체 흐름 속을 타고 가므로,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로써, 걱정할 일도 없고 어떤 것에 집착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자유스러운 무위자연의 전체상태가 되기 위해서 도를 닦는 것인데,
자신을 억지로 개인이라고 여기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행위의 습자체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도를 깨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런 충고는 무르익을대로 무르익은 아주 상근기의 구도자 부류에게는 적절한 말씀이긴 하지만,
아직 깨달음법에 대한 기초 개념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는 기초적인 무욕수행으로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지 못한 일반인,초급 또는 중급 구도자들에게는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벅찰 수도 있고, 부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깨달음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조차 이 무위법(無爲法)의 원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수행에도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우연스럽게 즉각적인 깨달음(敦悟)의 번개체험을 할 기회도 있을 겁니다.
執之者遠(失)也(집지자원(실)야) : (도를)억지로 붙잡으려 하는 자는 멀어지네(잃어버리네).
이말도 그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읍니다.
도를 얻겠다고 너무 집착하는 행위도 바로 개인의 욕망이며,
그러한 도를 깨치겠다는 욕망조차 마지막에는 내버려야 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자신이 무엇이 옳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스스로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도를 닦고 있는 그 사람 자체(주체)는 자각하지 않고, 경전이론이나 수행의 경험에만 관심을 줌으로써 본래 내면의 실체인 자기 자신은 항상 소외시킨 채로 엉뚱하게 대상만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빨리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 자기의 행위를 자각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자각하자마자 그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체 그 자체인 도를 대상화시켜서 도를 깨치겠다는 욕망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한,
본래 道와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無爲也 故無敗也(시이성인무위야 고무패야) ;이와같이 구도자가 억지로 행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 않고.
구도자가 있는 그대로에 머물러서,
개인의지적인 행위자 의식이 없다면,
도를 얻는데 실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道라는 것이 무위(無爲)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無執也 故無失也(무집야 고무실야) ; 집착이 없으므로 잃어버리지도 않네.
취하려고 집착한다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잘못 착각하여 찾아다녔지만,
원래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구태여 찾을려고 집착도 하지 않을 뿐더라, 잃어버렸다고 여기지도 않는 것이죠. 항상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으로 아무 할일이 없는 것입니다.(無事)
民之從事也 恒於其成事而敗之(민지종사야 항어기성사이패지);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늘 거의 완성단계에서 실패하네.
이 문장은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곽점갑본에는 없고, 그보다 시대가 어느정도 흘러가서 나온 곽점병본부터 나온 문장이라고 합니다.
곽점갑본에는 이 문장 대신 <臨事之紀> "일에 임하는 기본자세는"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만,
오히려 곽점 갑본이 더 간단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원래는 없었던 문장인데, 세월이 감에 따라 누군가가 <臨事之紀>를 개조한 글입니다.
이 문장은 아마도 밑에 있는<故愼終若始> "그러므로 마지막도 처음처럼 신중하라"라는 문장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후대에 개조한 문장인 것 같읍니다.
사람들이 일에 종사할 때는 항시 마지막 일이 완성될 즈음에서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이 글에서 표현한 것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실패하는 경우를 관찰해 보면 일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좌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다지만, 여기서는 구도자가 수행단계에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어느 단계에 까지는 도달했지만, 본인 자신은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깨달아야 되겠다는 욕망을 놓지 못하고, 깨달음에 대한 지성적 욕구나 특정종교이념등을 완전히 놓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훌륭한 지혜가 많다하더라도, 아직 최종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마지막까지 놓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故愼終若始(고신종약시); 그러므로 마지막도 처음처럼 신중하면
愼; 삼가다,근신하다,두려워하다,신중하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처럼 마지막 마무리도 신중하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온갖 노력을 해서 목표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그 동안에 노력한 보람마저 헛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도 처음처럼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도수행도 최종진아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실 아무리 수도를 오랫동안 하고, 경전을 수천권 왼다고 해도 범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음법에 대한 이론이나 경전은 하나도 몰라도 최종진아를 깨치면 그것으로써 구도수행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있는 그대로 무위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 노자도덕경에서는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則無敗事矣(칙무패사의); 곧 실패하는 일이 없네.
모든 것을 놓아 버리면 틀림없이 최종적인 도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최종적인 도를 얻는 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개체적인 "나"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是以聖人欲不欲(시이성인욕불욕) ; 그러므로 성인은 바라지 않음을 바라며
<欲不欲>은 "바라지 않음을 바란다"라는 뜻인데, 이 밑의 문장인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문장과 연련해서 "무욕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성인은 원래 수행을 해서 무욕을 얻은 사람인데,
왜 또 굳이 새삼스럽게 "무욕을 바란다"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아마도 구도자에게 <무욕(無欲)의 중요성>을 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성인의 무욕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읍니다.
而不貴難得之貨(이불귀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도인은 무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한 재화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금을 돌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敎不敎(學不學) 而復衆人之所過(교불교(학불학) 이복중인지소과);
가르침(말)없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지나쳐 버린 허물을 돌이켜 보도록 하네.
이 문장에서 곽점갑본은 <敎不敎>로 되어 있는데, 백서본은 <學不學>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뒤의 문장인 <而復衆人之所過> " 사람들이 지나쳐 버린 허물을 돌이켜 보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자면, 곽점갑본의 <敎不敎>가 백서본,왕필본의 <學不學>보다 더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敎不敎> "가르침 없는 가르침"으로 해석을 했읍니다.
<가르침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직접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도인 스스로 무위적인 행동을 하므로서 사람들이 저절로 도인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즉 도인은 <말없이 자연 무위적인 가르침>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들에게 많은 것을 저절로 가르쳐 줍니다.
마치 자연의 온갖 생주이멸(生住異滅) 변화현상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존재에 대하여 새삼 깨우쳐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는 것처럼 도인도 그렇게 무위적으로 말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敎不敎>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물론 <學不學>도 배운다는 입장에서 <敎不敎>와 동일하게 무위자연적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而復衆人之所過>에서 '사람들이 지나쳐 버리는 허물'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원래 본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스스로 되돌아 보도록 유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개인존재가 아니고,육체의 탄생과 죽음과는 관계없는 전체 의식이라는 진리를 깨우치도록 무위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말입니다.
是故聖人能輔萬物之自然(시고성인능보만물지자연);이렇게 성인은 만물이 저절로 있는 그대로가 되도록 도울 수 있을 뿐,
이렇게 성인은 만물의 존재자체는 <있는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말없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죽음과 삶을 넘어서 있는 도의 절대 본체 그 자체임을 깨우치도록 인도해주는 도움만 줄 뿐이라는 것이죠.
而不能(敢)爲(이불능(감)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네.
성인이 의도성을 가지고 능동적인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위적으로 그런 깨우침을 유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항상 저절로 빛나는 태양처럼,
성인은 보편적인 의식의 덕행과 자비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 빛을 저절로 비쳐준다는 것입니다.
곽점갑본에는 <能>자로 되어 있는데, 백서본,왕필본에는 <敢>자로 개조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곽점본의 <能>자로 해석을 했읍니다. 두 경우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이 64장은 구도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교훈들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유위행(有爲行)의 기본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들에게 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무심상태에서 안정되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이며,
후반부에서는, 유위행을 마친 상근기 구도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수행마저 다 내버리고, 오직 무위행(無爲行)으로 되어야 최종 절대본체에 안주할 수가 있다고 충고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 무한진인-
'성인들 가르침 > 노자도덕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자도덕경 66장, 자신을 낮추면 다툴 일이 없소이다. (0) | 2011.10.22 |
|---|---|
| 노자도덕경 65장, 모든 것을 아는 주시자로써 머무르시오. (0) | 2011.10.04 |
| 노자도덕경 63장, 무위행(無爲行)은 실행하기에 그리 쉬운것이 아니외다 (0) | 2011.09.18 |
| 노자도덕경 62장, 道로 나아가려면 내면의 뿌리가 되시오. (0) | 2011.09.02 |
| 노자도덕경 61장,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남에게 베품을 주는 것이오. (0) | 201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