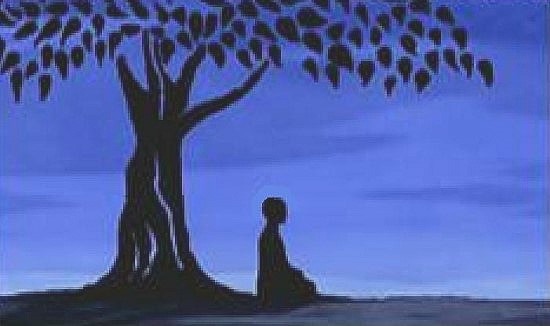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1. 9. 18. 21:19ㆍ성인들 가르침/노자도덕경
[무한진인의 노자도덕경 해설 63회]
[한문원문]
<곽점본>
爲亡爲 事亡事 味亡味
위망위 사망사 미망미
<大小之多易必多難> 是以聖人猶難之 故終亡難
대소지다이필다난 시이성인유난지 고종망난
<왕필본,백서본>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위무위 사무사 미무미
<大小多少報怨以德
대소다소 보원이덕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
도난어기이 위대어기세
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必作於細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
是以聖人終不爲大 故能成其大
시이성인종부위대 고능성기대
夫輕諾必寡信 多易必多難>
부경락필과신 다이필다난
是以聖人猶難之故終無難矣
시이성인유난지 고종무난의
[한글해석]
<곽점본>
행하는 바없이 행하고.
일하는 바 없이 일하며,
맛보는 바 없이 맛보라.
(위의 세구절에 대하여)
<'크다,작다'라는 (상대적인)분별심으로 아주 쉽다고 여기게 되면
틀림없이 큰어려움이 있게 되오.>
그래서 성인은 오히려 어렵다고 여기므로
그런 까닭에 결국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외다.
<백서본,왕필본 등>
행하는 바 없이 행하고
일하는 바 없이 일하며.
맛보는 바 없이 맛보시오.
<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한은 덕으로 갚으시오,
어려운 일을 하려면 쉬운 것부터 하고,
큰일은 미세한 것부터 해야하오.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부터 만들어지고,
세상의 큰일은 미세한 일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외다.
그래서 성인은 결국 큰일을 도모하지 않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오.
대저 가볍게 나오는 대답은 반드시 믿음이 적은 것이며
너무 쉬운 것은 반드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오.>
그러므로 성인은 오히려 어렵다고 여기므로
그런 까닭에 결국은 어려움이 없소이다.
[해 설]
이번 63장은 곽점본,백서본(26장),왕필본(63장) 등에 모두 포함되어 있읍니다만,
곽점본의 내용과 백서본,왕필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일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래 백서본의 원본문장은 글자가 많이 지워져서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몇개 안되지만,백서본 정리조 학자들이 기존의 왕필본 내용을 참조해서 왕필본 내용과 거의 똑같이 백서본 내용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곽점본과 왕필본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본 결과, 백서본(왕필본) 개작자들이 곽점본의 내용 중에서 일부 문장을 잘못 이해하였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백서본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후대에 개작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 해석은 본의 아니게 곽점본과 백서본,왕필본을 비교해 보는 기회가 되었읍니다.
곽점본의 내용은, "행함이 없이 행한다, 일함이 없이 일한다, 맛봄이 없이 맛본다"라는 도인의 일원적인 상태에 대하여 크다,작다고 분별하는 분별심, 즉 이원적인 지성으로 이해했다고 여긴다면 더 무지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성인은 아예 의식 넘어 모름(어려움)의 내면이 되므로써,
결국은 그 내면에서는 모름(어려움)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서본 왕필본에서는 처음과 맨 끝의 문장만 곽점본과 내용이 동일하고, 중간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의 문장들이 길게 서술되어 있어서, 곽점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그 방향이 틀어져 있읍니다.
따라서 본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백서본을 최초로 개작한 사람이 곽점본의 일부 문장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임의대로 다른 내용으로 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그 문제되는 문장 부분을 빨간색의 < >로 한문원문과 한글 해석문장에 표시를 해 놓았읍니다.
이제 곽점본 부터 해석에 들어가 보기로 하겠읍니다.
<곽점본>
爲亡爲 事亡事 味亡味 (위망위 사망사 미망미)
爲亡爲; 행함이 없이 행한다. 무위로써 행한다. 행하되 행하지 않는다.
事亡事; 일함이 없이 일한다. 무사로써 일한다. 일하되 일하지 않는다.
味亡味; 맛봄이 없이 맛본다. 무미로써 맛본다. 맛보되 맛보지 않는다.
이 세 문장에서 표현하는 것은 궁극적인 절대본체의 도를 완성한 도인의 자연스러운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깨달은 도인은 주,객 이원적인 마음을 초월하여 일원적인 상태에 안정되어 있읍니다.
<爲亡爲>에서 "亡爲"는 "無爲"와 같은 말입니다.
또한 "亡事" "亡味"는 각각 "無事" "無味"와 똑 같은 말입니다.
亡爲, 亡事, 亡味,는 "나"라는 개인성의 의지가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데,
"나라는 느낌"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인 에고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의지적으로 한다는 "행위자"라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에고의식이 없다는 것은 이원적이고 상대적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온갖 행위를 하고 일상 생활을 하며, 온갖 감각을 즐기더라도 의지와 마음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원화 마음상태의 지성으로는 이런 <爲亡爲 事亡事 味亡味>를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절대본체가 직접 되고, 그 속에 안정되어 보아야 이 상태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읍니다.
<爲亡爲>는 "행함이 없이 행한다, 또는 무위로써 행한다, 행하되 행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도인을 볼 때는 밥먹고,일하고 남들과 이야기를 하며 보통 사람처럼 행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인 그 자신은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인 자신은 "나"라는 에고적인 개인 마음과 자기가 행위자라는 행위자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므로 그 흐름의 일부분으로서 따라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위인 먹고 싸고 남들과 말하고 하는 모든 개인행동조차 전체흐름의 한부분으로 전부 맡겨 버린 상태입니다.
개인적이고 의지가 있는 개인 정체성이 완전히 녹아 버리고 전체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종일토록 행하지만, 하지 않음(亡爲)에 연유(緣由)하니, 그대로 무심(無心)상태에서 저절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事亡事>도 "일없음으로 일삼는다" 일은 하되, 자기가 일한다는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 애씀이 없이 저절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나"는 없고, 오직 전체적인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종일토록 일을 하되, 일 없음(亡事)에 연유(緣由)하니, 이 또한 무심(無心) 속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味亡味> 역시 "맛없음으로 맛을 본다, 맛보되 맛보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이것은 맛이라는 혀의 감각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육체 오감각작용을 대표해서 <맛>만을 내세운 것이며, 실제로는 육체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므로<감각작용의 없음으로 감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보되 보지 않으며, 듣되 듣지 않고, 맛보되 맛보지 않고, 느끼되 느끼지 않으며,(냄새를) 맡되 맡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읍니다.
종일토록 느끼지만, 맛보지 않음(亡味)에 연유(緣由)하니, 이 또한 無心 속에서 맛을 보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大小之多易必多難 (대소지다이필다난) ;
(위의 '위무위 사무사미무미' 세마디 말에 대해서)
'크다,작다'라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아주쉽다고 여기게 되면 틀림없이 크게 어려워진다.
이 문장은 위의 <爲亡爲 事亡事 味亡味>라는 말을 보통사람의 마음인 이원화의 상대적인 분별심으로 아주 쉽게 알수있다고 여긴다면, 더욱 어려움(무지)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즉, 위의 <爲亡爲 事亡事 味亡味>는 분별적인 마음을 초월한 일원적인 상태의 도인의 모습인데,
이것을 이원적인 보통마음수준에서 지성적으로 알고 나서 아주 쉽다고 여긴다면 틀림없이 무지의 어리석음에 더욱 빠져서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인의 일원적인 내면을 이원적인 지성으로 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무지의 작용입니다.
즉 의식인 앎의 지성을 넘어서, 내면의 미지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도를 공부하는데, 아예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의식넘어 내면의 모름 속으로 어렵게 들어가므로써, 결국에는 어려움조차도 없는 절대바탕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름이나 앎, 어려움이나 쉬움등은 모두가 이원적이고 상대적인 분별앎에 의해서 생긴 의식의 개념들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어휘가 나오는데, <大小> '크다,작다'라고 표현한 [상대적 분별심]입니다,
즉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이원성의 상대적인 마음상태를 <大小>라는 쌍대성 의미의 두 글자를 조합해서 "분별의식의 대체명칭"으로 표현했읍니다.
어떤 문장의 표현에서, 상대적인 의미의 두 글자가 조합된 단어로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유무(有無), 선악(善惡), 미추(美醜),상하(上下),장단(長短), 대소(大小), 강약(强弱), 진가(眞假),흑백(黑白)--- 등등 숫하게 많지만, 여기서는 <大小>를 선택해서 이원적인 분별의식의 명칭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였읍니다.
이 <大小>라는 말은 우리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마음을 말하는데,
지성적인 마음은 주객 이원적이며, 항상 상대적인 비교로서 판단하고, 논리성과 시간성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그 지성적인 마음이 비교 판별한다는 의미에서 <大小>라는 대표적인 쌍대성 계량단어를 분별의식의 대체명칭으로 사용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곽점본이래 그동안 수천년이 지났는데도 <大小>라는 단어의 참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석한 예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읍니다.
<多易>는 " 많이 쉽다, 너무 쉽다." , <必>은 "틀림없이", <多難>는 "많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크다,작다'라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아주 쉽다고 여기게 되면, 틀림없이 무지 속에서 크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우리말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백서본과 왕필본에서는 <한문원문>자체가 이 문장과는 전혀 다르게 개조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곽점본을 보고 처음 필사한 백서본시대 사람이 이<大小之多易必多難>이라는 문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풀어서 다시 쓴 것이 백서본과 왕필본의 한문원문의 < > 빨간색 괄호 안에 있는 문장들입니다.
백서본의 < >빨간 괄호 안의 문장들은 곽점본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기본 내용과는 전혀 아무 연관도 없는, 보통 일상 사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일반상식적인 요령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을 새로 엮어서 삽입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이 <大小>라는 "상대적인 분별심"과 반대되는 일원적인 도인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 넘어 전체가 하나가 된 무심상태, 마음이 없는 상태, 무위자연과 하나가 된 비이원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곽점본 한글 해석서는 이 문장을 "크든 작든 너무 쉽게 여기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아지네"라고 해석했읍니다만, <大小>를 "크던 작던"이라고 해석하면,그위의 <爲亡爲 事亡事 味亡味>라는 문장과는 의미적으로 연결이 단절되어, 별도로 뚝 떨어진 엉뚱한 이야기로 전환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是以聖人猶難之 (시이성인유난지); 그러므로 성인은 오히려 어렵다고 여기니
是以; 그러므로, 이와같이, 猶; 오히려 ,難之; 어렵다고 여기다.
'성인은오히려 어렵게 여긴다'는 말은, 보통 대상을 향해 있는 마음인 이원적인 지성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무지이며, 헛일이라는 것을 성인은 잘 알고 있으므로, 아예 모름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음,道, 절대상태라는 것은 이원적인 마음으로는 전혀 모르는 미지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항상 무한하게 전개되면서 종점없는 향상일로(向上一路)를 향합니다.
그래서 道란 이런 것이다,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적인 결론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그 개인의 정체성도 없읍니다.
그냥 그 상태가 항상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 스스로가 이해하는 것인데,
그 이해한다는 것은 의식 스스로가 그 근원과 합일되어 직접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참나를 직접 체득한다는 것이 바로 개인에고인 "나"가 사라지면서 일원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원화상태라는 말도 정확한 말이 아니며, 사실은 비이원적인 상태라고 해야 되겠지요.
"하나"는 "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가 있는 것이지, 둘이 합일 되면 그 하나조차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이원적(非二元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면 대상은 우리가 마음과 지성으로 저절로 알수가 있는 것이며, 조금 지성을 쓰면 무엇이든지 대부분이 대상적인 앎으로 이해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마음을 넘어서 의식을 초월한 내면만은 이원적이며 상대적인 지성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비이원적인 상태에 있읍니다.
바로 도인은 이렇게 앎과 모름의 넘어, 내면 깊숙히 들어가야 되므로, 이것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그저 말의 표현방식일 뿐이고, 말조차 끊어지고 자기존재조차도 모르는 깊은 상태로 들어 갑니다.
<難之> "어렵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마음 넘어"의 "모름"속으로 초월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故終亡難 (고종망난); 그런 까닭에 결국은 어려움이 없네.
故; 까닭에~, 終; 결국, 마지막엔, 亡難; 어려움이 없다.
성인은 마음 넘어 내면의 일원적인 절대 본체 그 자체에 안정되게 머무르면, 어렵다,쉽다는 그런 관념과 앎조차 있을 수가 없읍니다.
모든 이원성의 분별의식을 초월하여 전체가 하나인 비이원성의 절대의식상태에서 안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라는 개념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도덕경 63장의 곽점본 해석은 완료되었읍니다.
그 다음은 세월이 몇백년이 지나가면서 백서본과 왕필본에서는 이 곽점본의 문장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관찰해 보겠읍니다.
<왕필본,백서본>
爲無爲事無事味無味(위무위 사무사 미무미)
爲無爲; 행하는 바 없이 행한다.
事無事: 일하는 바 없이 일한다.
味無味; 맛보는 바 없이 맛본다.
이 세문장은 앞서 곽점본의 문장과 같은 뜻입니다.
마음을 넘어선 도인의 자연스러운 행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大小多少報怨以德 (대소다소 보원이덕)
大小多少; 크든 작든 많든 적든
報怨以德; 원한은 덕으로 갚으라.
이 문장은 그 앞의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와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주제의 "무슨일이든 원한은 덕으로 갚으라"는 말이 튀어나왔읍니다.
이 문장부터는 백서본 필사자가 곽점본의 大小之多易必多難 (대소지다이필다난)>이라는 문장의 정확한 뜻이 잘 이해되지 않으므로, 원래 문장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필사자 임의로 삽입하여 개작한 것 같읍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무슨 일이든지 원한은 덕으로 갚으라"라는 말은, "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한은 사랑으로 갚으라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데, 이것은 곽점본 <大小之~>에서 <大>에 해당하는 <도인의 깨달음 상태>즉 도인의 큰 자비 또는 "통이 큰일"이라고 해설하는 것 같읍니다.
그 문장 자체는 표준형 도덕교과서에 나올만한 명구절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곽점본의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앞뒤 문장과도 전혀 조화가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圖難於其易爲大於其細(도난어기이 위대어기세)
圖難於其易; 어려운 일을 하려면 쉬운 것 부터 하고,
爲大於其細; 큰일은 미세한 것부터 하라.
<圖難於其易>에서 <圖>는 "꾀하다", <難>은 "어려운 일", <於>는 "~에서 부터", <其易> "쉬운 것", 따라서 전체내용은 "어려운 일을 하려면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하라"는 뜻으로 일반적인 일처리 상식 요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爲大於其細>는 "큰일은 아주 작은 일부터 하라"는 말인데, 말하자면 큰 나무로 커지기 전에 아주 작은 새싹이 클때부터 미리 처리하라는 충고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려면 쉬운 것부터 하고, 큰일은 미세한 것 부터 하라>하는 문장도 곽점본의 <大小之~>문장에 관련하여 백서본 개작자가 "<大>는 큰일,어려운 일" 그리고 "<小>는 미세한 일, 쉬운 일"이라고 상상하며,나름대로 친절하게 해설한 문장인 것 같읍니다.
이문장은 다음 장인 64장의 일부 문장과 비슷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 자체야 일반사회에서 일을 처리하는 요령이나 효율적인 구도수행요령으로써는 아주 좋은 충고이겠지만, 지금 여기 노자도덕경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일원적인 도의 주제에 관련해서는 별 연관도 없는 주제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다음 장인 64장에도 실려 있으므로, 아마도 64장의 문장 일부를 모방해서 덧붙힌 것 같읍니다.
天下難事 必作於易天下大事必作於細(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
天下亂事必作於易;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부터 만들어지고,
위의 문장에서 "어려운 일은 쉬운 것부터 하라"는 말에 대하여 그 이유가 "어려운 일은 쉬운 일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장을 하나 새로 지어냈으니 그 말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그럴듯한 논리를 나름대로 펴고 있읍니다.
天下大事 必作於細 ; 세상의 큰일은 미세한 일부터 만들어진다.
이 말도 앞서 말한 " 큰일은 작은 일부터 하라"는 충고에 대하여 그 이유를 대고 있읍니다.
억지로 문장을 지어내다가 보니, 그 문장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이 이 이원적인 대상세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적으로 유익한 요령이기는 하지만, 곽점본에서 주로 다루는 기본주제와는 전혀 조화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인 64장에서 이와 비슷한 문장들이 나오므로 아마도 64장에서 이런 생각을 빌려 온 것 같읍니다.
是以聖人終不爲大故能成其大(시이성인종부위대 고능성기대)
是以聖人終不爲大 ; 그래서 성인은 결국 큰일을 도모하지 않으므로
故能成其大;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성인은 일부로 애쓰지 않으므로 오히려 큰일이 저절로 이루어질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도 역시 곽점본의 <大小之~> 문장에서 <大>, 즉 도인의 깨달음 상태의 큰일에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해설한 문장입니다.
夫輕諾必寡信多易必多難(부경락필과신 다이필다난)
夫輕諾必寡信; 대저 가볍게 하는 대답은 반드시 믿음이 적은 것이고
多易必多難; 너무 쉬운 것은 반드시 큰 어려움에 닥친다.
이 문장들도 앞뒤 문장하고는 전혀 연결되지않고 불쑥 튀어나온 문장인 것 같읍니다.
이 말들도 따로 떨어져서 보면 일상사에서는 좋은 경구일지는 몰라도,
이 도덕경 63장에 들어갈 만한 문장으로는 적절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문장은 백서본의 개작자가 나름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교묘하게 구성해서 삽입한 문장인 것 같읍니다.
즉 곽점본의 <大小之~>의 뜻에 해당하는 문장을 여러 줄을 나열하여 해설한 (불법?)개작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문장인 것 같읍니다.
본 필자가 약 2000년전의 백서본 필사자를 대신해서 한번 그 이유를 말해 보겠읍니다.
"대체로 일반사회에서도 지나가는 투로 가볍게 대답하는 말은 별로 믿지를 않는 것처럼,
너무 간단하게 표현된 곽점본의 <大小之~>라는 짧은 문장은 겉으로는 쉽고 평범한 말이지만, 이도덕경에서의 <大小之~>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틀림없이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본 백서본 개작자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쩔수없이 여러 해설문장을 덧붙혔 놓았음을,여기서 그 이유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위의" 대저 가볍게 하는 대답은 믿음성이 적은 것이고, 너무 쉬운 것은 반드시 어려움에 부닥치는 것이오"라는 문장에서 표현한 내용이 바로 그 이유를 기록한 것이라고 본 필자는 판단했읍니다.
그런데 위의 백서본 문장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곽점본의 大小之多易必多難>에서 뒷부분의 <多易必多難>를 마지막에 삽입한 것을 보면, 개작자가 <大小之>의 뜻을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절인 <多易必多難>만 집어넣어 그 위에 있는 문장들의 결어로써 대치한 것 같읍니다.
다시 말하면 <大小多少 ~~~夫輕諾必寡信>의 문장은 곽점본의 <大小之~>를 <대>와 <소>로 구분해서 친절하게 해설한 문장이며, 마지막으로 <多易必多難>을 그대로 삽입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大小~ ~~~~~~~~~~多易必多難>으로 곽점본 원문이 한글자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백서본과 왕필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물론 "大小之~"에서 "之"자가 한글자 빠지긴 했읍니다.)
그 당시도 노자도덕경(곽점본)의 본문 한글자 한글자가 마치 종교신앙처럼 신성하게 숭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노자도덕경에 손을 대서 함부로 해설을 덧 붙혔지만, 그 기본 원문의 한문글자는 한글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키고 있는 것 같읍니다.
결론적으로, 백서본(왕필본 )의 63장의 개작자가,
곽점본 문장의 <大小之多易必多難>에서 <大小之>라는 문장을 잘못 이해하고는
이 <大小之>를 <大>와 <小>로 나누어서 각각 여러문장으로 실례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大>를 도인의 "깨달음 상태의 큰일", 그리고 <小>를 <미세하고 작은 일>로 구분해서 상상하면서 설명한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은 백서본, 왕필본의 63장에서 위의 <大小多少>문장부터 <夫輕諾必寡信>까지 전체문장들은 불필요하게 해설한 쓸데없는 문장임이 여기서 밝혀졌다고 본 필자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是以聖人猶難之故終無難矣(시이성인유난지 고종무난의)
是以聖人猶難之; 그러므로 성인은 오히려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故終無難矣;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이 없네.
이 부분은 곽점본의 마지막 문장이 그대로 보존되었읍니다.
이 위의 < > 안의 문장들은 백서본 개작자가 이 결론적인 문장과 의미적으로 조화를 맞추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며 애써 지어낸 문장들인 것 같읍니다.
이번 63장은 곽점본을 먼저 해석하고, 백서본, 왕필본 원문을 곽점본 해석내용과 비교해 본 결과, 곽점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백서본과 왕필본의 한문 원문은 그 내용이 곽점본에서 묘사한 내용과는 방향이 너무 빗나가 있는 것 같읍니다.
말하자면 백서본과 왕필본의 덧붙힌 내용은 원래 곽점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원문의 방향을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개작한 것이 드러나므로써,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백서본과 왕필본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또한 백서본의 개작된 부분은 64장의 일부 문장을 모방한 듯한 감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곽점본, 백서본,왕필본,기타본등의 글자와 내용의 차이는 이 63장 뿐만 아니라, 노자 도덕경 전장에 걸쳐서 꽤 많이 있읍니다.
지금까지 필자가 노자도덕경을 각 판본을 비교해 가며 가능하면 도학의 입장에서 옳바른 문장만 골라서 해석을 하려고 애썼읍니다만, 더욱 세밀하게 탐색해 보면 곽점본 이후에 나온 후대 판본들 속에 잘못 개작된 부분들과 잘못 판별한 한문글자들이 꽤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63장의 해석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다소 다른 의견 또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몇번이고 정독을 해보면, 왜? <大小>를 "상대적인 분별심"으로 해석을 했는지 결국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63장의 핵심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 보자면,
무위자연의 도를 깨치려면 상대적인 마음과 이원적인 지성을 통해서 알려고 할 수록 무지의 어려움 속에 빠지지만, 내면의 모름 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넘어서면, 어려움조차 없는 <행하는 바 없이 행하고, 일하는 바 없이 일하며,느끼는 바 없이 느낀다>는 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무한진인-
'성인들 가르침 > 노자도덕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자도덕경 65장, 모든 것을 아는 주시자로써 머무르시오. (0) | 2011.10.04 |
|---|---|
| 노자도덕경 64장,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평온함에 머무르시오. (0) | 2011.09.22 |
| 노자도덕경 62장, 道로 나아가려면 내면의 뿌리가 되시오. (0) | 2011.09.02 |
| 노자도덕경 61장,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남에게 베품을 주는 것이오. (0) | 2011.08.25 |
| 노자도덕경 60장, 큰 나라는 작은 생선을 불에 익히는 것처럼 다루어야 하오. (0) | 2011.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