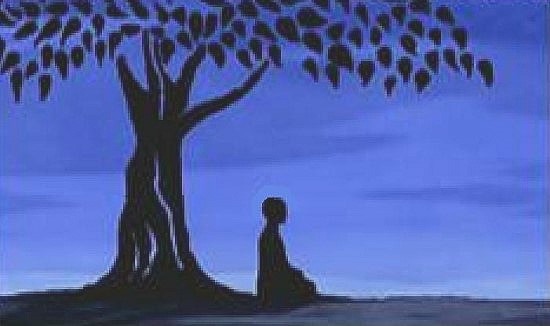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1. 2. 5. 12:20ㆍ성인들 가르침/노자도덕경
[무한진인의 노자도덕경 해설 74회]
[원문]-백서본
若民抗且不畏死 奈何以殺懼之也 ?
약민항차불외사 내하이살구지야
若民抗畏死 則而爲者 吾將得而殺之 ?
약민항외사 칙이위자 오장득이살지
夫孰敢矣 ?
부숙감의
若民抗且必畏死 則抗有司殺者
약민항차필외사 칙항유사살자
夫代司殺者殺 是代大匠斲也
부대사살자살 시대대장착야
夫代大匠斲者 則希不傷其手矣
부대대장착자 칙히부상기수의
[한글해석]
만약 백성들이 항거하면서 또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들에게 죽음으로써 위협을 주며 대응할 수 있겠소?
만약 백성들이 항거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 하고 있는데,
무위자연의 법도를 실천하고 있는 무리들인,
우리들이 대부분 (그 법도를) 알고 있는데 그들을 죽이겠소?
그대들 중에서 누가 함부로 그런 짓을 하겠소?
만약 백성들이 항거하면서도 또한 죽음을 두려워 한다면
항거에 대한 자연법칙에는 죽임을 관장하는 자가 (따로) 있소이다.
그대들이 죽음을 관장하는 자(하늘)를 대신해서 그들을 죽인다면
이것은 숙련된 대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일과 같소.
그대들이 대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다면
곧 자기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드믈 것이오.
[해 설]
이번장은 왕필본 74장, 백서본 39장에 해당되며, 곽점본에는 없는 장입니다.
본 해석에서는 다른 기존의 왕필본 해석내용과는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좀 많읍니다.
기존의 해석과 다르게 된 주원인은 왕필본 원문이 약간 변경되어 있었으며,
또한 몇개의 한문글자의 뜻을 기존의 다른 해석서들이 한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았읍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간추려 보자면,
이 74장은 다른 장과는 달리 좀 특별한 상황에서 쓰여진 글인 것 같읍니다.
즉 도를 숭상하는 군주가 나라 안에서 일부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반란백성들을 진압하러 출정하는 진압군의 지휘관들에게 특별하게 작전지시를 하는 연설문인 것 같읍니다.
즉, 반란백성들이 만약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독이 올라 있으면, 잡히기만 하면 그즉시 사형깜이라고 위협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로로 붙잡힌 몇사람을 시범적으로 그들 앞에서 사형시키면서 그 분노한 백성들을 위협한다해도, 이미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죽음에 대한 협박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충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반란백성들 중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무위자연의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은 우리들 중에서 어떻게 사람을 쉽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을 절대 임의적으로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읍니다.
아무리 잘못한 반란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대들 진압군들이 백성들을 임의대로 죽인다면 하늘 대신에 사람의 운명을 끊어버린 것이므로 그 죽인 당사자도 인과 업보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득하고 있읍니다.
문장별로 세밀하게 해석해 보겠읍니다.
若民抗且不畏死(약민항차불외사); 만약 백성들이 항거하며 또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若; 만약, 抗; 항거하다,대항하다,반항하다. 且; 또한, 畏; 두려워하다. 死;죽음.
이 문장은 원래 백서갑본에서는 <若民恒且不畏死>인데, <항>자가 항상<恒>로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막을<抗>자로 고쳐서 해석을 했읍니다.
왜냐하면 항상<恒>으로 해석을 하면 의미적으로 조화가 전혀 맞지 않아서 말이 연결이 잘 안됩니다.
백서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만약 백성이 항상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항상 또한>이라는 연결어 때문에 도저히 말의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백서본 해석서를 예를 들어보면," 만약 백성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이렇게 해석하여 문장 중의 <恒且>는 그 해석을 슬그머니 무시해 버렸읍니다.
또한 왕필본 원문을 보면 <民不畏死>로 간단하게 축소되어 <若>자와 <恒且>를 아예 빼 버렸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왕필본시대부터 이 문장의 <恒且>가 해석이 잘 안되므로 아예 원문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원래는 백서본이 발굴된 직후에 백서본 문자를 정리하는 학자들이 항상<恒>자가 잘못됨을 발견하여 그것을 막을 <抗>자로 변경해 주었어야 후대사람들이 옳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백서본 정리조 학자들이 이것이 잘못된 글자라는 것을 뱔견하지 못한 것이죠.
노자도덕경의 곽점본,백서본에는 글자들이 본래 뜻과 엉뚱한 다른 글자로 변경되어져 있는 것이 무척 많은데, 지금 우리가 보는 통용본이라고 하는 왕필본은 그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전수해 내려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정되어 알기쉬운 글자로 정리되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옛날, 백서본에 이렇게 한자들을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의도적으로 틀린 글자로 집어 넣었을까요?
그것은 몇가지 종류의 이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예는 그 당시 황제나 왕의 이름자 또는 왕의 년호(年號)등의 명칭에 사용한 글자는 함부로 아무데서나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금지된 글자가 나오면 비슷한 음의 다른 한자로 변경한 예가 많이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문장 내용을 일부 의미를 감추거나 비밀로 숨기기 위해서 음이 비슷하거나 모양이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글자로 바꾸어 필기한 경우도 흔하게 있읍니다.
또한 그 당시의 한자 뜻이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에서 쓰는 뜻과 전혀 달라진 경우도 있읍니다.
또 다른 경우는 여러사람들이 필사해서 전수되는 과정에 필사자들이 잘못 알고 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꾼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한 옛날 어느 시기에만 쓰였던 특별한 글자나, 그 지방에서만 독특하게 만들어 쓴 글자가 현시대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고어(故語)나 사라진 글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없어진 글자들을 전문학자들이 다시 복원하여 다른 글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뜻이 다른 글자로 바꿔지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백서본이나 곽점본의 글자가 전혀 다른 것을 그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연구하고 수정하여 오늘날에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와 문장으로 계속 재정리되면서 모두가 알기 쉽게 해석이 된 것이죠.
이 문장도 역시 어떤 이유 때문에 막을 <抗>자가 항상<恒>자로 잘못 전수된 것을 그 동안 어떤 학자도 눈여겨 보지 않고 수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읍니다.
그래서 위 문장은 막을 <抗>자로 읽는 것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명확한 뜻으로 전체 문장이 조화롭게 해석이 됩니다.
만일 왕필본처럼 무조건<전체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과 막을 <抗>자로 고쳐서 해석을 해서 <만약 백성이 항거하며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화된 문장과 비교해 보면 그 해석내용이 명확하게 <항거하는 반란백성들의 일부집단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왕필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나라 안의 전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칫 잘못 이해 될 수 밖에 없읍니다.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항거를 한다면 군주로써는 그보다 더 중대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극단적으로 반항하는 반란백성들을 진압하는데 한두사람 생포하여 시범적으로 공포감으로 위협을 주기 위해서 사형을 시킨다고 해도 그 반란군중들이 겁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아래 문장에 나옵니다.
이문장의 왕필본 원문을 보면<民不畏死>라고 간단히 되어 있읍니다.
해석은 "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라고 해석되어, "백성들이 항거한다"는 내용은 빼버렸읍니다.
奈何以殺懼之也?(내하이살구지야); 죽임으로써 그들에게 겁주는 방법으로 어찌 대응할 수 있겠소?
奈; 대처하다,대응하다,어찌, 何; 어찌, 懼; 위협하다,두렵게 하다.
반란을 속히 진압할 목적으로 한 두사람 시범적으로 죽여서 다른 반란백성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도록 위협한다고 해서, 자기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반란백성들이 죽을 가봐 겁이 나서 항거를 포기하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몇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군중들이 분노가 더욱 불 붙으면 그때는 더욱 걷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저항할 수도 있겠죠.
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죽음으로 위협해 보아야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왕필본은 원문은<奈何以死懼之?>이며,
해석은 " 어찌 죽임으로써 백성들을 두렵게 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으며,
본 백서본 해석과 비슷합니다.
若民抗畏死 則而爲者(약민항외사칙이위자);만약 백성이 항거하며 죽음을 두려워 한다면,
무위자연법을 실천하고 있는 자들인~
則; 준칙, 무위자연의 법, 爲者; (도를)실천하는 자들(무리), (도를) 닦고있는 자들.
<若民抗畏死>에서 <항>자도 원문에는 항상 <恒>자인데,여기서는 본 역자가 임의로 막을 <抗>자로 바꾸었읍니다.
따라서 "만약 백성이 항거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 한다면"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則而爲者>는 "무위자연법을 닦는 자" 또는 "무위자연법을 실천하는 자"라고 해석됩니다.
<則>은 지켜야 할 법이나 규정,준칙등을 의미하지만,
이 노자도덕경에서는 인의적으로 만든 법규가 아니라,<도의 무위자연법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무위자연의 법칙이란 바로 道를 말하며, 하늘의 法, 자연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則而爲者>는 "무위자연법을 실천하고 있는 자(무리)" 또는 "무위자연의 도를 닦고 있는 자(무리)"라고 해석이 됩니다.
무위자연의 도를 닦은 성인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을 진압하러가는 진압군 지휘관에게 무위자연의 도를 실천하는 우리들이 반란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된다고 지시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왕필본은 원문부터 다르게 되어 있읍니다.
<若使民常畏死而爲奇者>로 변경되어 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그러한 기괴함을 일삼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었는데, 원래 백서갑본의 원문 내용과는 아주 다르게 표현되어 있읍니다.
吾將得而殺之?(오장득이살지); 우리들이 대부분 (그 도를)알면서 그들을 죽이겠소?
吾; 그대(들) 將; 대부분,거의 대체로, 得; 알다,만나다,이르다.
<吾>는 "나"라는 뜻도 있으나 여기서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우리(들)"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군주가 반란백성들을 진압하려고 출정하는 진압군 지휘관들에게 "우리들은~" 하고 아군을 지칭하며 연설을 하는 말입니다.
<吾將得>은 "우리들이 대부분 (하늘의 자연법을) 알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군주가 반란백성을 진압하러 출정하는 진압군 지휘관에게" 만일 반란백성이 항거하다 붙잡혔는데 죽음을 두려워 하고 있는 그 백성을 무위자연의 도를 잘 알고 있는 구도자로써 그대가 그들을 죽이겠소?"하고 묻고 있읍니다.
이 문장을 의문형 강조문 형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반란백성들을 죽인다"라는 결정적인 내용이 되어서, 전체문장이 조화가 전혀 맞지가 않읍니다. 이문장을 의문문 형식으로 해석해야지 "죽이지 말라"는 강조된 지시사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위자연법은 사람이 인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옳다,그르다,라는 이원적인 판단을 하여 행동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인의적인 어떤 행위와 판단이 없이 자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무위자연법을 실천하는 道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나오는 <則>은 자연법을 말하며, 반란백성을 억지 재판하여 사형시키거나 다른 무리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 금지하며, 하늘의 자연적인 판결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해석서들은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의도적으로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잡아서 죽일 것이네"라고 해석되어 있어서, 이는 잘못 해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즉 기존의 해석서는 <吾>를 "나"라고 해석하고, 의문문으로 해석하질 않았읍니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서들은 이 문장에서 좀 의미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 해석에서는 기존 해석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했읍니다.
왕필본의 원문은 <吾得執而殺之>라고 변경되어 있으며,
"내가 잡아들여 죽일 것이다"라고 해석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전체 메세지와는 상반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눈에 잘못된 원문과 해석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읍니다.
夫孰敢矣(부숙감의); (대저) 그대들 중에서 누가 함부로 그런 짓을 하겠소?
夫; 대저, 그대들 대부분이,대체로, 孰;누구, 敢; 함부로, 무모하게, 감히, 矣; 어조사
<夫>는 보통 "대저, 대체로"라고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그대들 중에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읍니다.
위의 문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의문문 형식으로 진압군 지휘관들에게 반란백성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강력한 어조로 재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왕필본 원본은 <孰敢?>이고,
해석은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는가?"
若民抗且必畏死(약민항차필외사); 만약 백성들이 항거하면서도 또한 오로지 죽음을 두려워 한다면
이 문장도 <抗>자는 백서본 원문에는 항상<恒>자 였지만, 막을 <抗>자로 바꾸어서 해석을 해보니 아주 적절하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 백성들이 조정에 항거는 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항거를 진압한 후에 포로로 붙잡혀서 목숨은 살려달라고 용서를 바라는 반란백성을 말하는 것 같읍니다.
왕필본에는 이 문장은 빠져 있읍니다.
則抗有司殺者(칙항유사살자); 항거에 대한 자연법칙에는 죽임을 맡는자가 (따로)있소.
恒; 항상,늘, 有; 있다. 司; 맡다,지키다.
<則抗>으로 항상<恒>자를 막을 <抗>자로 한문자를 바꾸어서 해석해 보면,
<則抗有司殺者>는" 항거에 대한 자연법칙에는 죽임을 맡는 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읍니다.
"항거하는 자에게는 자연적으로 죽음을 맡은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무위자연의 도를 따르는 글이 됩니다. 그 죽음을 맡은 자는 바로 사람이나 국기기관이 아니라, 자연, 즉 하늘이 죽음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위자연, 즉 하늘의 재판관이 저절로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은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하는 일은 사람이 억지로 작위(作爲)를 가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사람이 억지로 ,인의적으로 작위(作爲)하지만 않고, 있는 그대로 진행되는 자연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무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에 항거하다가 붙잡힌 반란백성들의 목숨도 인의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형을 관장하는 자는 자연적인 운명, 즉 하늘의 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則抗有司殺者>를 "항거에 대한 법규에는 죽임을 맡은 자가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람이 인의적으로 만든 반역법에 위반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관청이 있다는 말로 들리므로, 이것은 <法治主義>, 즉 법가(法家)계통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노자의 무위자연의 도와는 다른 글이 됩니다.
왕필본 원문은 <常有司殺者殺>로 변경되어 있으며,
해석은 "언젠나 죽임을 주관하는 관리를 두어서 죽여야 하는데"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형집행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반란백성의 사형을 그 전담부서에서만 집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얼뜬 들으면 그럴 듯한데, 사실은 노자도덕경의 무위자연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백서본원본의 <則>자를 빼버리므로써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죽임을 전담하는 자>는 나라의 전담관리가 아니라, 하늘이 준 자연운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잘못 이해한 것이죠.
夫代司殺者殺(부대사살자살); 그대들이 죽임을 맡은 자를 대신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夫; 남자, 그대들, 代; 대신하다.
<夫>는 "그대들" 이라는 뜻으로 '진압군 지휘관'들을 지칭하는 복수지칭 대명사입니다.
<司殺者>는 여기서는 "자연" 또는 "하늘의 운"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에서 죽음의 운명을 관장하는 죽음의 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 자연적인 운명의 신을 대신해서 그대들 장수들이 인의적으로 백성들을 대신 죽인다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필본 원문은 백서본과 동일합니다.
是代大匠斲也(시대대장착야); 이것은 대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것이오
是; 이것은, 匠; 장인,기술자,목수, 斲; (나무를) 깎다.
원래 하늘의 운명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데, 하늘의 신 대신에 백성의 목숨을 죽인다면,
마치 대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大匠>으로 클<大>자가 들어간 것은 아마도 전체 우주의 목수, 즉 신(神)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읍니다. 하늘의 운명 神을 뒤로 제쳐놓고 대신에 감히 개인이 남의 목숨을 직접 빼앗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왕필본 원문은 <是謂代大匠斲>이며,
해석은 대략 백서본과 비슷합니다.
夫代大匠斲者(부대대장착자); 그대들이 대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다면
"그대들"이란 바로 반란백성들을 진압하는 진압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만이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데, 감히 진압군인 그대들이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왕필본 원문도 이와같읍니다.
則希不傷其手矣(칙희부상기수의); 곧 자기 손을 다치지 않는 자가 드믈 것이오.
則; 곧, 希; 드물다, 傷; 다치다,상처나다. 其手; 자기 손.
만일 백성들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면 그 죽이는 자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읍니다.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남의 목숨을 해치는 행위는 틀림없이 그 행위의 당사자도 인과업보로써 손상받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읍니다.
이번 74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이건 사람의 목숨은 해치면 안된다는 충고를 들었읍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하늘만이 관장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사람이 사람 목숨을 해칠 때는 그 해친 사람도 역시 다칠 수 밖에 없다는 인과 응보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새겨 두어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무한진인-
'성인들 가르침 > 노자도덕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자도덕경76장, 경직된 것은 죽은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것이오 (0) | 2011.02.10 |
|---|---|
| 노자도덕경 75장, 삶이란 아무것도 아닌 무(無)일 뿐이라고 여기시오. (0) | 2011.02.05 |
| 노자도덕경 73장, 하늘그물 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0) | 2011.01.28 |
| 노자도덕경72장, 성인은 외면을 버리고 내면에만 의지하오. (0) | 2011.01.16 |
| 노자도덕경71장,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道를 깨치는 것이오. (0) | 201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