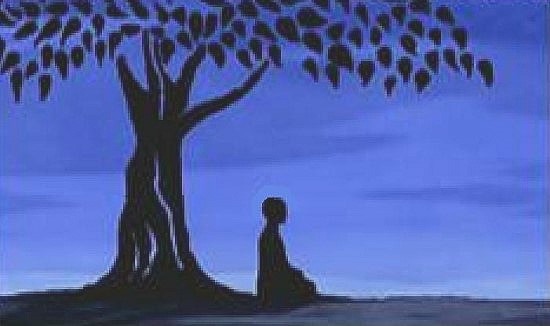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8. 10. 10. 10:06ㆍ성인들 가르침/초기선종법문
[本文]
본심에 융회(融會; 하나로 합치,계합됨) 되면 청정해지나 (한마음) 일어나면 바로 생멸의 세간이 된다.
그 가운데서 상념하면 그릇된 생활을 짓게 되며, 법을 구함에 분별하는 행이 변하지 아니하고,
구르고 굴러 더욱 때가 늘어나 마음 수행에서 구경(궁극)에 이르기 어렵다.
지혜로운 분(설산동자; 보살 因行 때의 석가)께서는 잠깐 여덟글자(生滅滅已 寂滅爲樂; 생멸이 멸하면 적멸이 樂이로다) 를 듣고 곧바로 이(理)를 깨달아 6년간의 고행이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비로소 알았다.
세간에서 어지럽게 소란 피우는 이들은 모두 마인(魔人)이며, 헛되이 떠벌리고 헛되이 다투면서 허망하게 지견을 짓는다.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면서 입으로 약방문을 말하나 하나의 병도 고치지 못한다.
본래로 적적(寂寂; 텅비어 고요함)하여 본래 보는 상(相;見相)이 없는데 어찌 선과 악, 삿됨과 올바름이 있을 것인가.
생(生) 또한 그대로 불생(不生)이며, 동(動)함 또한 그대로 부동(不動)이고, 정(定;禪定) 또한 그대로 정(定)이 아니다.
[譯註者 解說]
1. 본심에 융회되려면 심성(心城)이 본래 일어남이 없음(心不起)을 뚜렷이 알아 그 뜻이 자심(自心)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마음 일어남 없으니 분별 떠나고, 분별 떠남이 곧 청정이며 진여(眞如)이다.
석가불께서 보살인행시에 듣게 된 "생멸이 멸하니 적멸하여 낙(樂)이로다"에서 적멸이 곧 분별 떠남이고 심불기(心不起)인 자리이다.
2. 심불기(心不起)인 자리(心性)를 먼저 요지(了知;뚜렷이 앎, 깨달아 앎)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지견만 증장시킨다면 본심이 드러나는 데서 더욱 멀어진다. 그래서 "심성을 먼저 보아 성불한다(見性成佛)"고 하였다.
<육조단경>에서 자주 강조한 '식심견성 (識心見性;심성을 알라!)'도 같은 뜻이다. 그래서 불교는 선오후수(先悟後修)의 가르침이다.
3. 마음이 본래 공적(空寂)하여 견(見)한다 함이 없이 견(見)한다.
마치 거울이 견(見)한다 함이 없이 비추는 것과 같다.
심성이 본래 이러한 까닭에 어떠한 상념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그대로 상념함이 없는 자리이다.
마치 거울이 동(動)함이 없어 만상이 비추이듯, 상념의 동(動)이 드러남은 그 자리의 바탕이 동(動)하지 않은 까닭이다. 즉 동(動)인 자리의 바탕은 비동(非動)이며, 상념하는 자리의 바탕은 무념(無念)이다.
마찬가지로 선정의 상이 드러남도 그 바탕이 비선정(非禪定)인 까닭이다. 번뇌에서 바로 번뇌가 아님을 본다.
그래서 <금강경>에 "만약 모든 상(相)이 그 상이 아님(非相)을 보면 바로 여래(如來)를 봄이다. "고 하였다.
<화엄경>에 "번뇌가 곧 보리(覺)다"고 하였다. 이 양면의 뜻을 다 알고 양변(兩邊;二邊)에 치우침이 없으면 모든 분별을 떠나니 이것이 곧 중도(中道)이다. 이 중도란 양변의 뜻에 의해 나온 것이어서 중도의 자리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양변을 떠나 있지 않으니 양변의 뜻이 중도에서 살아난다. 그래서 견(見)함이 없이 견하고, 분별함이 없이 분별한다고 하였다. 중도는 상념을 떠난 자리인데 중도라는 상념을 일으키면 이는 망념이 되어 버린다.
[본문]
그림자는 형체로 인해서 생기고, 메아리는 소리를 따라 나온다.그림자를 쫓아다니느라 형체를 수고롭게 함은 형체가 그림자의 근본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소리를 떨쳐 메아리를 멈추게 하려 함은 소리가 메아리의 근본임을 모르는 까닭이다.
번뇌를 제거하여 열반을 구함은 비유컨대 형체를 제거하고 그림자를 찾는 것과 같다.
중생을 떠나 불(佛)을 구함은 비유컨대 소리를 그쳐서 메아리를 나오게 하려 함과 같다.
까닭에 미혹과 깨달음이 하나의 길이며, 어리석음과 지혜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자리에 억지로 이름을 세운 것이어서 그 이름일 뿐이니 무엇이 생한 것이 아니다.
이(理)가 없는 자리에 (방편으로) 억지로 이(理)를 지은 것인데 그 이(理)에 근거(執着)하면 쟁론이 일어난다.
환화(幻化)여서 진실이 아니거늘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겠는가. 허망하여 실(實)이 없거늘 어찌 유(有)라 하고 무(無)라 하겠는가. 마땅히 알지니 얻되 얻음이 없고, 잃어도 잃음이 없는 것이다.
아직 담론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이 구절 정도만 기술하고자 하나니 어찌 현지(玄旨;현묘한 뜻)를 (이 자리에서 다) 논할 수 있겠는가.
[譯註者 解說]
1.유(有)를 떠나 공(空)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당처(當處)의 당념(當念)을 떠나 어디에 따로 불(佛;如來,眞如,本覺)이 있는 것이 아니다. 파도 그대로 항상 바닷물일 뿐이되, 파도를 떠나 바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파도 그 자리가 실은 그대로 바닷물이다. 당념 당처 그대로 있다고 할 바가 없다(無所有). 그래서 무원무구(無願無求)가 되어야 한다. 무엇을 얻으려 하고 구함이 있으면 '일체법(一切法) 불가득(不可得)'의 뜻에 어긋난다.
능(能;見分)과 소(所:相分)가 따로 없어 일심(一心)이니 무엇으로 향할 바 없고, 취할 바 없다.
2.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영상이고 그림자이며 환(幻)과 같은 것이다. 텅 비어 고요하고, 어디에 있는 바 없이 있는 마음에 모든 현상은 수중월(水中月)과 같다.
- 보리달마론의 이입사행론 잡록(담림편집, 박건주 譯註)-
'성인들 가르침 > 초기선종법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마음의 본성, 그 핵심가르침의 세 가지 주안점 (0) | 2018.10.15 |
|---|---|
| 현종기(顯宗記)-11 (0) | 2018.10.13 |
| 반야무지(般若無知) (0) | 2018.10.09 |
| 마음 마음 하는 그 마음은 찾기 어렵도다 (0) | 2018.10.05 |
| 평등심(平等心)이란? (0) | 2018.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