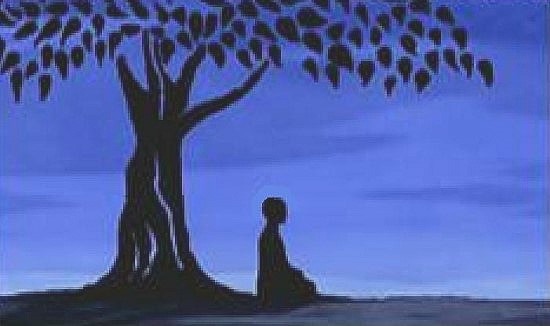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5. 10. 16. 10:20ㆍ성인들 가르침/능엄경
[무한진인의 능엄경 공부하기 84회]
3-1. 맺힌 것을 푸는 일
2) 부처님이 게송으로 다시 설하심
[본문]
[爾時世尊 欲重宣此義 而說偈言이라 ]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기 위하여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본문]
[眞性有爲空이라 緣生故如幻이며
無爲無起滅하니 不實如空華하니라
言妄顯諸眞이면 妄眞同二妄이라
猶非眞非眞이어니 云何見所見이리요
中間無實性할새 是故若交蘆니라 ]
참다운 성품에는 유위법이 공(空)하거늘.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허깨비와 같다네.
무위는 생기거나 없어짐도 없어서
진실되지 못함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라
거짓을 말하여 진실을 나타낸다면
오히려 진실도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거니
어찌하여 보는 놈이다 보이는 물질이다 하겠느냐.
중간에 진실한 성품도 없나니
그러므로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허깨비와 같느니라
[해설]
우리의 본체인 여래장 묘진여성 자리에는 유위법(有爲法)이 전혀 없다(空)는 것입니다.
왜 없다(空)고 했을까요? 인연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환(幻)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위법(有爲法)은 모두가 내면의 파동성 의식의 홀로그램 작용이 오근에 의하여 드러난 것인데,
파동성은 항상 순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서 어떤 실체성이 없으므로 헛것이라는 것이죠.
참다운 성품에는 유위법이 없다는 것은 바로 유위법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멸(生滅)이라는 것은 바로 파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시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0>가 되었다가 <1>이 되었다가 순시적으로 변하는 파동성을 다른 말로 생멸(生滅)한다는 말입니다.
유위(有爲)의 상대적인 것은 무위(無爲)인데, 무위인 허공은 생멸하지 않죠, 즉 허공은 파동성이 없다는 것이며, 파동성이 없는 것은 여기서 다 무위(無爲)라고 말합니다. 무위는 기멸이 없다는 말은 파동성이 없다는 것이죠.
<진실됨이 허공꽃과 같다>는 말은, 위 본문에서 유위(有爲)는 유(有,있음)을 말하고, 무위(無爲)는 공(空)을 말하는데, 참 본성 자리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空)과 유(有)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승(二乘)은 공(空)에 집착하고, 중생은 유(有)에 집착하는데, 참 본성에서는 유(有)도 없고, 공(空)도 없으므로, 범부나 이승(二乘)이 집착하는 것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위는 공(空)하고, 무위법(無爲法)은 허공꽃과 같아서 실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딘가에서 허공의 꽃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허공꽃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 같지만,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 허공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無起滅)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有)의 상대적인 공(空)도 또한 허공꽃이므로 참성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거짓을 말하여 진실을 나타낸다면>에서, 유위와 무위는 둘 다 허망한 거짓이며, 거짓이 아닌 것이 참성품이라는 말입니다. 거짓을 말해서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거짓에 대한 상대적인 참(眞)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상대성이 있는,이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참(眞)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둘 다 거짓이라네> 에서, 거짓을 말하면서 거짓이 아닌 것이 참진리라고 한다면, 그 참진리도 상대적인 진리이지 절대적인 참진리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거짓과 참진리는 둘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도 진실 아닌 것도 아니니>에서, 참도 아니고 참 아님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뜬 생각하기에는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면 될 텐데,참 아닌 것과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 그 참 아님도 아님을 이중부정하는데, 이것은 전혀 개념적인, 어떤 생각과 개념도 끼어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 입니다.
<어찌하여 보는 놈이다, 보이는 물질이다 하겠느냐?>에서, 보는 놈은 주체를 말하니깐, 여기서는 근(根)을 말하는 것이고, 보이는 물질은 보여지는 대상을 말하니깐, 근(根)의 대상인 진(塵)을 말합니다. 보는 근(根)과 보여지는 진(塵)을 모두 부정하는 말입니다.
<중간에 진실한 성품이 없느니>에서, 근(根)의 작용과 대상인 진(塵)의 사이에 식(識)이 있는데, 식(識)도 실제 성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허깨비와 같느니라>에서, 한문 원문에서는 갈대들이 여럿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근(根), 진(塵),식(識)의 세 가지가 인연작용으로 인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비유한 것이며, 실제로는 환(幻)이며,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結解同所因이오 聖凡無二路라
汝觀交中性하라 空有二俱非하니
速昧卽無明이오 發明使解脫이니라 ]
맺히고 풀림이 다 그 원인이 같고
성인과 범부가 본래 두 길이 아니다.
너는 갈대단 가운데 그 어우러진 성품을 보아라.
공(空)과 유(有)의 두 가지가 모두 아니니.
어두워 미혹되면 곧 무명이요
열리어 밝으면 그대로 해탈일 것이다.
[해설]
<맺히고 풀림이 다 그 원인이 같고>에서, 맺히면 범부이고, 풀으면 성인인데, 그 맺히고 풀리는 것이 다 같은 육근
을 말합니다. 즉 맺힌 것도 근(根)이 맺힌 것이고, 푸는 것도 근(根)을 푸는 것이니까, 그 원인은 육근을 말하는 것
입니다.
<성인과 범부가 본래 두 길이 아니다>에서, 근이 맺힌 것에 집착하면 범부요, 근을 풀면 성인이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근 하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생사가 모두 육근 때문이라고 하고, 열반도 육근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는 갈대단 가운데 이 어우러진 성품을 보아라>에서, 갈대 숲에서 속이 빈 가는 갈대들이 서로 서로 기대고 얽
혀서 서 있거나 바람에 휘날려도 쓰러지지 않는 상태를 눈여겨 보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서로 인연작용에 의하여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공(空)과 유(有)의 상대적인 개념의 허망함을 말합니다.
< 공과 유의 두 가지가 모두 아니니>에서, 여기서 공(空)이 아니라는 것은 소승(小乘)이 집착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고, 유(有)가 아니라는 것은 범부가 집착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즉 물질도 아니고, 공(空)의 깨침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혹하여 어두우면 곧 무명이요>에서, 참성품을 잊으면 어두워져서 그것이 곧 무명(無明)이라는 것입니다.
<열리어 밝으면 그대로 해탈이다>에서, 어둠(無明)에서 밝음(明)이 일어나게 되면 무명이 없어지고 밝음이
나타나듯이, 속박과 해탈이 무명(無明)과 명(明)의 관계일 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解決因次第와 六解一亦妄이니
根選擇圓通하면 入流成正覺하리라 ]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를 따르나
‘여섯의 매듭’이 풀리면‘하나’라 할 것도 없는 것이니
감각기관(根)중에 원만한 놈을 선택해서
그 흐름에 들어가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해설]
<매듭을 푸는 데는 차례를 따르나니>에서, 이것은 보통 일상에서 실이나 끈같은 것이 뒤엉켰을 때에 매듭을 풀려면
차근 차근 애당초 맺힌 순서의 차례대로 다시 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여섯 매듭이 풀리면 하나라고 할 것도 없으니>에서, 여기서 '여섯'은 육근(六根)이 아니고, 육결(六結)이므로, 육근이 풀리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의 근(一根),즉 예를 들면 이근(耳根)에서만 여섯개의 매듭이 있는데,
그 여섯개의 매듭을 다 풀면 하나라고 하는 것도 없었진다는 말입니다. 즉 매듭이 있기 때문에 푼다는 말이 있지,
매듭을 다 풀어 버린다면 '풀었다'는 말이 있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하나'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에서 원만한 놈을 선택해서>에서, 육근(六根) 가운데서 어느 것이 원만하고 원통하지 않은지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제일 원통한 근(根)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 흐름에 들어가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에서, "흐름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성인의 무리에 들어간다는 말
입니다. 즉 근이 풀리는 때에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서 옳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가장 원통한 한 근을 선 택에서 여섯 매듭이 풀리면 하나조차도 없어져서, 전체로써 작용하게 되어 성인의 흐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阿陀那細識은 習氣成暴流하니
眞非眞恐迷일새 我常不開演하노라 ]
아타나(阿陀那)의 미세한 의식(識)은
습기가 사나웁게 유전(流轉)하나니
다시 진(眞)과 비진(非眞)으로 미혹될까 염려스러워
나는 항상 말하지 아니했노라.
[해설]
<아나타의 미세한 의식은 습기가 사나웁고 유전하나니>에서, 아타타식은 제8아뢰아 종자식이므로 미세식이라고
했는데, 파동적으로 아주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지극히 짧은 미세한 파동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습기란 잠재의식의 종자(씨앗)를 말하는데,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와 생각의 업이 종자형태로 잠재해 있다가
어떤 인연으로 풀리면서 드러나는데, 그 업과를 금생에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을 받게 되는데, 그 습기의
흐름이 마치 폭포수같은 거친 파동의식의 흐름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필림에 저장된 동영상들을 습기가 저장된 종자들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필름을 돌려서 영화상영을 하면 장면들이 한꺼번에 펼쳐지면서 움직이는데, 이런 것을 사나웁게 유전(暴流)한다고 표현 한 것입니다. 제8식 가운데 잠재해 있던 종자씨앗들이 활성화되어 밖으로 거친 파동의식의 흐름이 되어 쏫아져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진과 비진으로 미혹될까 염려스러워>에서, 眞은 참성품이고, 非眞은 거짓을 말하는데, 참과 거짓이 있다는,즉 이원적인 개념으로 잘못 알까 염려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항상 말하지 아니했노라>에서, 소승에서나 대승에서나, 생사(生死),열반이 다 根으로 인(因)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육근은 거짓이고, 육근의 성품 자체는 참성품인데, 참성품과 참성품이 아님의 이원성의 개념에 붙잡힐 것 같아서 그런 애기를 지금까지 안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됬다고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自心取自心하면 非幻性幻法이니와
不取無非幻이니 非幻常不生이어늘
幻法云何立이리오 ]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얻고자 하면
환(幻) 아닌 것이 환법(幻法)이 되거니와,
취하지 아니하면 비환(非幻)이라 할 것도 없다.
비환(非幻)이라 할 것도 생기지 않는데
환법(幻法)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해설]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에서, 自心은 여래장 묘진여성을 말하는데, 제8식 가운데는 見分과 相分이 있습니다. 見은 능히 보는 육근의 작용이고, 상(相)은 육진(六塵)이 생기는 것인데, 相이든 見이든, 보는 주체든 보이는 대상이든, 모두가 하나의 여래장 묘진여성에서 나온 동일체 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내 마음 안에서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으로 나누어서 분별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환 아닌 것이 환법이 되고자>에서, 본래 여래장 묘진여성은 환(幻)이 아니지만, 육근과 육진은 환(幻)입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인데, 즉 취하려고 하지 않으면 幻이 안나타나지만, 취하려고 하면 육근과 육진이 갈라져서 幻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非幻이라고 할 것도 없다>에서, 자기 마음에서 취하지만 않으면, 幻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非幻도 동시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에 비이원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환이라 할 것도 생기지 않는데 환법이 어떻게 생기겠느냐?>에서, 非幻도 없어지는데 幻法이 어떻게 생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六根을 푸는 방법은 根과 塵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곧 집착한다는 것이므로, 전혀 취하지 않는것이 바로 이 공부법이라는 것이죠.
[본문]
[是名妙蓮華며 金剛王寶覺하고
如幻三摩提이며 彈指超無學하리니
此阿毗達磨가 十方薄伽梵이
一路涅槃門이니라 ]
그러므로 이것을 이름 하여 묘연화(妙蓮華)라 하며
금강왕보각(金剛王寶覺)이라 하고
여환삼마제(如幻三摩提)라 하며
이를 얻으면 손가락을 퉁기는 짧은 순간에
더 배울 것 없는 무학(無學)을 초월하게 되니
이러한 가르침[阿毗達磨]이 바로
여러 부처님[薄伽梵]께서 경유하셨던
오직 한 길, 열반에 이르는 문이다.
[해설]
묘연화는 법화경을 말하고, 금강왕은 금강반야경을 말하며, 보각이라는 것은 묘연화와 금강왕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즉 이 능엄경이 법화경의 근본도 되고, 금강경의 근본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환 삼매제>는 수행에서 얻은 삼매가 환(幻)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환과 같으냐 하면 닦을 것이 없이 닦는 것이고, 증(證)할 것이 없이 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환삼마제라고 한 것입니다. 삼마제라고 하는 것을 닦아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끝에 가서 얻는 것인데, 어떤 상(相)에 집착해서 어떤 행(行)을 해서 닦는 것이 아니라, 닦을 것이 없이 닦는 것, 증(證)할 것이 없이 증하는 무수지수(無修之修), 무증지증(無證之證)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재가 아닌 환(幻)과 같은 삼마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얻으면 손가락 퉁기는 짧은 순간에 더 배울 것없는 무학을 초월하게 되니>에서, 유(有)를 해탈하면, 소승 아라한인 무학(無學)까지 오르고, 공(空)까지 해탈하면 아라한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부가 그렇게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이 겪으신 유일한 열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무한진인-
'성인들 가르침 > 능엄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능엄경 공부(87) (0) | 2015.11.06 |
|---|---|
| 능엄경 공부(86) (0) | 2015.10.30 |
| 능엄경 공부(83) (0) | 2015.10.05 |
| 능엄경 공부(82) (0) | 2015.09.28 |
| 능엄경 공부(81) (0) | 2015.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