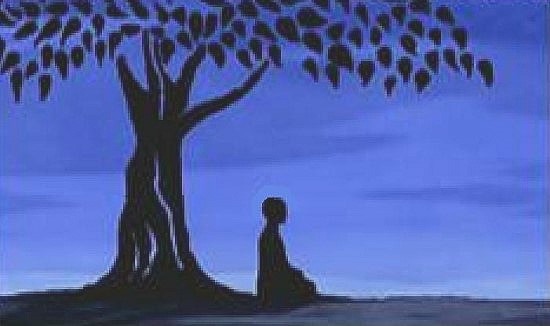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1. 6. 26. 10:42ㆍ성인들 가르침/노자도덕경
[무한진인의 노자도덕경 해설 54회]
[한문원문]
善建者不拔 善保者不脫
선건자불발 선보자불탈
子孫以祭祀不絶
자손이제사불절
修之身 其德乃眞
수지신 기덕내진
修之家 其德有餘
수지가 기덕유여
修之鄕 其德乃長
수지향 기덕내장
修之邦 其德乃豊
수지방 기덕내풍
修之天下 其德乃普
수지천하 기덕내보
以身觀身
이신관신
以家觀家
이가관가
以鄕觀鄕
이향관향
以邦觀邦
이방관방
以天下觀天下
이천하관천하
吾何以知天下之然哉 ?
오하이지천하지연재 ?
以此
이차
[한글 해석]
道의 바탕에 잘 세워진 것은 뽑히지않고,
道의 바탕에 잘 보존된 것은 벗어나지 않소.
(그러므로) 대대로(도에 대한)숭배가 끊기질 않는 것이오.
개인 자신이 도를 닦으면
그 덕이 곧 참됨이고,
한 가정이 모두 도를 닦으면
그 덕으로 (한가정이) 넉넉하게 되고,
한 마을이 모두 도를 닦으면
그 덕으로 곧 마을이 커지게 되며,
한 나라가 모두 도를 닦으면
그 덕으로 곧 나라가 풍요롭게 되오.
온 세상이 모두 도를 닦으면
그 덕으로 곧 우주전체에 두루 道가 펼쳐지는 것이오.
자신으로써 자신을 스스로 지켜보고,
한 집안으로써 집안을 스스로 지켜보며,
한 마을로써 마을을 스스로 지켜보고,
한 나라로써 나라를 스스로 지켜보며.
전체 세상으로써 이 세상을 스스로 지켜보는 것이오.
천하가 처음부터 그러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지켜보는 자각(自覺)때문이외다.
[해 설]
이번 54장은 곽점본,백서본(17장),왕필본(54장) 등 모든 본에 공통으로 있는 문장입니다.
각본의 글자와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읍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장래에 왕이나 지도자가 될 예비 지도자에게 도에 대해서 항상 벗어나지 말라고 충고해 주는 글 같읍니다.
일단 도를 완전히 깨치면 안정되어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도에 안정되면 대대 손손이 전승되고 숭배를 받는다고 일러주고 있읍니다.
그래서 도를 닦으면 개인으로써, 가정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한사람으로써,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전체 세상으로써 어떤 공덕을 얻을수 있는지를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한 인간으로써 자신을 자각하고, 한 가족으로써 자기 가정을 자각하고, 한마을 구성원으로서 자기마을을 자각하고, 한나라 국민으로써 자기나라를 자각하며, 전체 세상이 되어 전체세상을 자각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이글의 주제는 자기가 무엇과 동일시 하든 그것과 일체가 되어,"스스로를 돌이켜지켜보라" 또는 "스스로를 자각하라"는 가르침인 것 같읍니다.
만물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바로 그 아는 앎 자체가 자각이라고 암시하고 있읍니다.
善建者不拔 善保者不脫
선건자불발 선보자불탈
善: 착하다,좋다,옳다, (여기서는)도에 안정된 마음. 建 ; 세우다. 拔;뽑히다. 脫;벗다,벗어나다,나오다.빠지다.
善建者不拔; 도의 바탕에 잘 세워진 것은 뽑히지 않고,
善保者不脫; 도의 바탕에 잘 보존된 것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두문장에서 <善>이라는 의미는 "도의 바탕에서 나온 순수한 특성"을 말합니다.
도는 절대바탕, 즉 일원화적인 상태이므로 그것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원적인 관점에서 도인의 특성을 묘사할 때에,
이 노자 도덕경에서는 절대바탕인 도를 통해서 직접 나오는 순수한 마음작용을 <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절대바탕의 도를 통해서 직접 나오는 행위를 <德>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善>과 <德>은 일원적인 절대 도의 바탕에 머물러 있는 도인에 있어서 현상세계에 나타난 <마음>과 <행위>를 이원적인 입장에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善建者不拔>에서 <善建者>는 "도의 바탕에서 잘 세원진 것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해석서들은 <가장 잘 세워진 것은-->이라고 번역들을 했읍니다만, 단순히 이원적인 의미에서 <가장 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일원적인 도의 바탕에 단단하게 안정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한 문장입니다.
<善保者不脫>도 역시 <도의 바탕에서 잘 보전된 것은 도의 밖으로는 잘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석됩니다.
<善保者不脫>에서 <保>자는 곽점본의 글자이고 ,백서본이나 왕필본에서는 <抱>자로 바꾸어져 있읍니다.
<善抱者不脫>은 <가장 잘 안은 것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해석되어 보전할<保>자나 안을<抱>자나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도에 안정되어 있는 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도로부터 이탈하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子孫以祭祀不絶
자손이제사불절
子孫; 대대로 ,以 ;하다, 祭祀; 제사, 絶;끊어지다, 곽점본에서- 屯;어렵다.험난하다.
子孫以祭祀不絶; 자손 대대로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구절은 자칫 잘못 이해하면 대대손손이 조상에 대하여 유교식의 조상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그런 유교식 조상숭배 형식적인 제사의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도가 철학과 도가수행의 실질적인 전승이 계속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노자도덕경의 無爲自然철학으로 인해서 황제와 노자를 신봉하는 황노학이 융성했고, 뒤이어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도교와 심신양생술이 성행했으며, 음양오행설과 불교 개념, 인도 요가 등이 혼합되어 여러가지 수행법과 무술단련, 기수련등등이 현대의 과학만능시대까지 정신과학의 일환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지만, 그 바탕은 노자도덕경에서 나온 기본개념에서 분화되고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읍니다.
또한 인도의 불교수행법과 중국의 노자 무위자연철학이 융합하여 중국고유의 독특한 선불교(禪佛敎) 수행체계가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현대의 불교역사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도가의 무위자연철학에 대한 전승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어떤 형태로든 보존된다는 것을 자손대대로 제사의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 같읍니다.
노자 도덕경의 무위자연철학은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하여 수많은 지식인들이 해석한 책자가 헤아릴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많은 연구서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읍니다.
修之身 其德乃眞
수지신 기덕내진
修; (몸과 마음을)닦다, 身; 자신(개인), 乃; 이에,곧,즉, 眞; 참마음,진리.
修之身; 한개인인 자신으로써 (도를) 닦으면
其德乃眞 ; 그 덕이 곧 진실되고
한사람으로써 몸과 마음을 닦으면, 그 공덕으로 진리를 깨친 참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身>은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써의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修之家 其德有餘
수지가 기덕유여
修之家; 한 가정이 모두 도를 닦으면
其德有餘; 그덕으로 (한가정이)여유있고 넉넉하게 지내며
한 가정의 모든 가족구성원이 도를 닦으면, 그 공덕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넉넉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도를 닦으면 우선 물질적인 욕심과 집착이 없어지므로 가족 구성원 각자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모두가 나와 너라는 구분이 없으므로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있겠죠.
修之鄕 其德乃長
수지향 기덕내장
修之鄕; 한 마을 사람이 모두 (도를)닦으면
其德乃長 ; 그 덕으로 곧 마을이 크게 성장한다.
한 마을 전체가 도를 닦는다면 그 평화로운 기운의 공덕으로 마을이 크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長>은 "길게 뻣친다" 또는 "크게 성장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修之邦 其德乃豊
수지방 기덕내풍
修之邦; 한 나라가 모두 (도를) 닦으면
其德乃豊; 그 덕은 곧 나라의 풍요 그 자체다.
한 국가 전체가 도를 닦는다면 그 공덕으로 그 나라 전체가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요롭다는 말은 평화롭게 살기 좋다는 의미겠지요.
修之天下 其德乃普
수지천하 기덕내보
修之天下; 전체세상이 모두 (도를) 닦으면
其德乃普; 그 덕이 곧 우주전체에 두루 펼쳐진다.
전체세상이 모두 도를 닦으면 그 덕이 전체에 두루 편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세상인 자연은 이미 도와 덕이 널리 펼쳐져 있죠.
따라서 위의 표현은 전체 세상사람들이 전부 도를 닦으면 온 세상이 널리 그 공덕으로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以身觀身
이신관신
以身觀身; 자신으로써 자신을 지켜본다.
이 문장은 곽점본에는 없는 문장입니다.
백서본과 기타 왕필본등에는 나와 있는데, 원래는 없었던 문장을 백서본 시대에 누군가 삽입한 것 같읍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켜본다"는 말은 "스스로를 자각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을 되돌아 본다는 것인데, 자신을 되돌아 봄으로써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스스로 제어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도를 바탕으로 자신을 되돌아 본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회광반조(廻光反照), 즉 의식 빛을 내면의 바탕으로 되돌려서 비추어 본다는 뜻이며, 이것이 바로 자각(自覺)입니다.
절대자각(自覺)은 자기인식(自己認識)과는 다릅니다.
절대자각은 시간요소가 無이며, 자기인식은 시간요소의 길고 짧음이 있읍니다.
자기를 되돌아 보는 작용은 비슷하지만,
절대자각은 보는자(주체) 와 보는 대상(객체)이 일체가 되어 틈이 없는 상태(無漏)이기 때문에 주객이 분리되지 않은 일원화 상태이며, 앎이 없는 자각상태이지만, 자기인식상태는 보는자 와 보는 대상이 분리되어 보는 작용이 이루어지며, '나' 가 주체와 객체의 이원화로 분리되어서 앎이 밖으로 나타나는 상태(有漏)입니다.
따라서 "자기자신으로서 자신을 지켜본다"는 것은 바로 일원적인 자각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감지하고 제어하면서 스스로 작동하는 대부분의 기계장치들은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기기가 많은데, 그 기본 원리는 감지센서에서 출력된 정보가 어떤 표준되는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그 벗어난 오차만큼 감지된 출력숫치를 역으로(-) 입력에 휘드백(궤환작용,되먹임)해 주어 원래 동작상태로 수정하여 회복해 주게 끔, 기계 스스로 입력정보과 출력정보의 오차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스스로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읍니다.
이 감지된 출력오차만큼 마이너스 오차를 다시 입력쪽에 휘드백 시켜주는 것이 바로 자동화 제어기기들의 자동 오차 제어장치(feedback network system)입니다.
이와같이 기계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감지하여 스스로 제어하는 휘드백 제어시스템이 마치 기계가 자기자신을 되돌아 지켜보는 자기인식 또는 자각작용과 비슷한 동작입니다,
보편적 자각상의 오차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의식을 비롯하여,에고마음 ,육체 ,이 현상세계등 이원화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가 출력에서 나온 오차이며, 이원화 오차가 스스로 그 의식자체 속으로 합일되어 잠겨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제로(0,無) 오차가 되어야 비로소 주객 이원화가 사라지고 일원적인 자각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기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되돌려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자기생각이나 언행을 끊임없이 자각하면, 그 자각작용이 저절로 생각과 언행을 자동으로 옳바른 방향(無心)으로 점차 교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처음에는 주객이원적(主客 二元化)이고, 시간의 경과가 있으며, 앎이 밖으로 나타나지만, 끊임없는 명상과 수행에 의해서 이 자기인식이 점차로 보는자와 보는 대상이 가까워져서, 결국은 시간간격과 앎이 사라지게 되어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일체가 되면, 일원적(一元的)인 자각(自覺)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절대자각상태는 입력과 출력이 동일해지는 절대공진(共振)상태로 비유할 수가 있읍니다.
절대 자각상태는 보는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으며, 앎도 없고, 전체가 일체인 상태를 말합니다.
근세기에 나온 수행법 중에서 "나는 누구인가?"하고 자기내면을 향해서 되묻는 자아탐구 수행법이 대표적으로 자기 휘드백 제어시스템 같은 자각수행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이 절대자각상태는 절대 존재상태이며, 또한 시간성이 제로파장의 절대공진상태가 되며, 이를 명상체계에서는 절대지복 상태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절대바탕을 초월적 존재(定),초월적 지복(動),절대 자각(知), 이 세가지 요소가 일체가 하나로 뭉쳐진 부동(不動)의 일원화 상태로 표현들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고금동서의 모든 도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지켜보는 자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한결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이란 바로 이 자각(自覺)작용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以家觀家
이가관가
以家觀家; 집안사람으로써 자기 집안을 스스로 지켜보며
<以家>는 "집안사람으로써"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그 집안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되돌아 보는 자각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자기 가정을 스스로 자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가정이고, 가정이 나다, 라는 가정과 자기를 동일시하여
가정과 내가 일체가 되어 스스로 되돌아 본다는 것입니다.
以鄕觀鄕
이향관향
以鄕觀鄕; 마을로써 자기마을을 스스로 지켜보고
마을사람으로써 자기마을과 일체로써 동일시하여 스스로 되돌아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처럼 마을을 지켜 본다는 것입니다.
以邦觀邦
이방관방
以邦觀邦; 한 나라 백성들이 자기나라를 스스로 지켜보며,
이 문장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스스로 자기나라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나라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以天下觀天下
이천하관천하
以天下觀天下; 전체 세상으로서 세상을 지켜본다.
이 문장도 내가 전체세상과 일체가 되어 나자신을 지켜보듯이 세상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吾何以知天下之然哉 ?
오하이지천하지연재 ?
; 천하가 처음부터 그러한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천하가 스스로를 지켜보는 자각을 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묻고 있읍니다.
以此 : 바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지켜보기 때문이네.
<以此>는 <이것으로써 안다>라는 의미입니다만, '이것'이란 모든 것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본다' "자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스스로를 지켜보는 자각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자각작용의 앎으로 인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번 54장은 곽점본과 백서본과 왕필본에 모두 공통으로 있는 문장입니다.
핵심 주제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과 하나가 되어 스스로를 자각하라는 충고인 것 같읍니다.
스스로를 지켜보는 것, 즉 자각(自覺)이 바로 道를 향하는 수행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 자각작용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어떤 변화에도 관계없이,의식 넘어 지금 여기에서 늘 상존(常存)하고 있는 것(지켜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한진인-
'성인들 가르침 > 노자도덕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자도덕경 56장,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道人이오. (0) | 2011.07.07 |
|---|---|
| 노자도덕경 55장, 덕이 두터운 도인은 어린아이와 비슷하오. (0) | 2011.07.01 |
| 노자도덕경 53장, 큰길(大道)는 지극히 평탄하오. (0) | 2011.06.20 |
| 노자도덕경52장,근원으로 되돌아가면 평생동안 근심이 없소. (0) | 2011.06.17 |
| [무한진인의 노자도덕경 해설 후기] 노자도덕경과 작은 별나라 어린 왕자. (0) | 201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