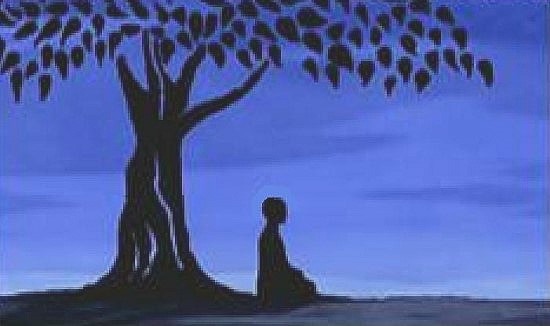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9. 6. 13. 19:50ㆍ성인들 가르침/과거선사들 가르침
제10문 : 간화(看話)와 반조(返照)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매양 참 선인들이 서로 논쟁하니, 바라건대 자상히 논변하여 밝혀 주소서.
제10답 : 나는 웃으면서 말한다. 위에서 물은 바는 엇비슷이 곡조가 같아서 들을 만 하지만, 여기에서 물은 뜻은 또다시 바람이 별조(別調)로 부는구나. 하지만 나의 한 마디 말을 들어보아리.
큰 코끼리가 강을 건넘에 흐르는 물을 가로지르니
토끼와 말이 밑바닥에 닿지 못함을 관계치 말라.
알겠는가. 만일 알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날 그대들과 더불어 자세히 말하리라.
옛날에 앙산스님이 위산스님에게 물었다.
"어떠한 것이 참 부처의 주처(注處)입니까?"
위산이 말하였다.
"생각으로써 생각없는데 이르게 하는 오묘함으로써 신령한 불꽃의 무궁함을 반조(返照)하여서 생각이 다하여 근원(根源)으로 돌아가면 성상(性相)이 상주하여 일과 이치가 둘이 아니요, 진불(眞佛)이 여여하다"
앙산이 그의 말에 곧바로 대오(大悟)하였다. 그후 심문분(心聞賁)선사가 이 화두를 들어서 말씀하였다.
" '생각으로써 생각 없는데 이르게 하는 오묘함으로써 신령한 불꽃의 무궁함을 반조하여서 생각이 다하여 근원(根源)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무슨 정결한 법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시끄러운 티끌 속에 들어가서 거스르고 순응한들 무엇이 물들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성나게 하리오. 그러한 이후에 밝음과 어둠 두 가지를 철저하게 타파하여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곳을 향하여 '대비원에 재가 있다는 것을 본다(大悲院裏有齋)는 것이 화두(話頭)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註 : 대비원이유재(大悲院裏有齋) : 진주땅의 보화화상이 평소에 늘 시중(市中)에 둘러서 방울을 흔들면서 말하기를 "밝음이 오면 밝음으로 때리고, 어둠이 오면 어둠으로 때리고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바람으로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로 대린다." 하였다. 하루는 임제선사가 한 스님을 시켜서 "다 그렇지 않게 울 때는 어떠합니까?"하고 묻게했더니, 보화화상이 이르기를 "내일 대비원에 재가 있으리라'하였다. 그 스님이 돌아와서 임제스님에게 말하니 임제선사가 이르되 "내가 종래로 그 사람을 의심했느니라"하였다. 이 일화에 대하여 임제, 대혜 등 많은 선사들이 다투어 송(頌)을 붙여 거양(擧揚)하므로서 화두가 되었다. ]
앙산은 '신령한 불꽃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말에 이미 대오하였거늘, 심문분(心聞賁)선사는 무엇 때문에 다시 화두를 관(觀)하도록 하였을까?
깨달음을 얻은 자가 모두 앙산과 같다면 다시 말할 것이 없으려니와, 만일 앙산의 깨달은 바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견(知見)이 없어지지 않아서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할 것이다.
생사의 마음을 타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심무분 선사가 반조하는 가운데 철저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특별히 말한 것이다.
또한 고봉(高峯)은
"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의 화두를 들다가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닌다'는 언구(言句)를 타파하여 대지가 잠기고 물아(物我)를 모두 잊어서 정(定)을 잡고 주인이 되었지만, 설암스님의 '잠잘 때에 꿈도 없고 생각이 없는 곳에서는 주인이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곧바로 대답할 말이 없고 말할 수 있는 이치가 없었다.
설암스님이 다시 나에게 '일각주인공(一覺主人公)이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을 하는가'를 관(觀)하도록 하였는데, 결국은 함께 잠자는 도반스님이 목침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물 속에서 뛰어 나온 듯이 툭 트이어 한 생각에 작위가 없어 천하가 태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옛 사람이요, 옛날의 행리(行履)가 바뀌지 않았다." 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일귀하처(一歸何處)는 화두(話頭)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일각주인공(一覺主人公)을 보라'는 것이 관조(觀照)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고봉은 이미 '일귀하처'에서 굳건히 정(定)을 잡고 주인이 되었는데, 설암스님은 무엇 때문에 힐책하여 다시 '일각주인공(一覺主人公)을 보도록 하였을까?
이는 특별히 화두를 보는 가운데 철저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이와 같이 가르쳐 준 것이니, 과연 무엇이 우수하고 무엇이 열등하며, 무엇이 원만하고 무엇이 편벽하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깨달음이 철저하고 철저하지 못함이 사람의 진실과 허위, 구경(究竟)을 얻었느냐와 못 얻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방편의 우열(優劣)과 심천(深川)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삼가 불조(佛祖)의 정법(正法) 위에서 부질없이 이견(二見)을 내어 스스로 장애와 어려움을 지어서는 안 될것이다.
종고(宗皐)선사가 영시랑(榮侍郞)에게 보내는 답서에 이르기를,
"다만 일상생활의 인연이 있는 곳에서 무시로 살피되, 내가 타인과 더불어 명쾌히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끊어버림은 누구의 은혜를 입은 것이며, 필경 어느 곳에서 유출되었는가를 살피고 살핀다면 평소에 생처(生處)인 화두는 스스로 숙처(宿處)가 되리니, 생처(生處)가 이미 숙처(宿處)가 되면 숙처(宿處)는 도리어 생처(生處)가 될 것이다. 어느 곳이 숙처(宿處)인가. 5음(五陰), 6입(六入), 12처(十二處), 18계(十八界),24유(二十四有) 등 무명업식(無明業識)으로 사량계교(思量計較)하는 심식(心識)이 밤낯으로 아지랑이처럼 번뜩여서 잠시도 쉼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하나의 끄나풀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사에 유랑케하며 모든 고통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이 하나의 끄나풀이 이미 화두가 되면 보리열반과 진여불성이 문득 현전(現前)하게 될 것이다.
현전(現前)한 때에 이르러서는 또한 현전했다는 사량도 없어야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옛스님이 깨달음을 얻고서 말하기를, '눈에 응할 때에는 일천개의 태앙이 비춤과 같아서 만상이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고, 귀에 응할 때에는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크고 작은 소리가 족히 응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니, 이와 같은 일들은 다른 데에서 구하지 않고 다른 힘을 빌리지도 않은 것이다. 자연히 인연에 응할 때에 활발하고 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음을 얻지 못한다면, 또한 세간의 속된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량이 미치지 못한 곳을 돌이켜서 사량하여 보아라.
어느 곳이 사량이 미치지 못한 곳인가.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묻기를,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하니, 조주스님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하나의 글자에 어떠한 기량이 있는 것일까? 청컨대 안배하여 헤아려 보도록 하라. 계교와 안배를 놓아둘 곳이 없을 것이니, 다만 뱃속에서 번민하여 마음에서 번뇌할 때가 바로 좋은 시절이어서 제8식이 서로 차례로 행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깨달은 때에는 놓아버리지 말고 다만 '무자(無字)를 들어야 한다. 이를 이끌어 오고 이끌어가면 생처(生處,낯선 곳)는 스스로 숙처(宿處,익숙한 곳)가 되고 숙처(宿處)는 스스로 생처(生處)가 될 것이다."
고 하였으니, 대체로 일용 인연처에서 살피고 살피는 것이 반조가 아니겠는가.
사량진로(思量塵勞)의 마음을 가지고서 '누자(無字)'상으로 돌아가 이를 들어서 놓지 않는 것이 화두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종고선사 또한 사람들에게 반조하는 것으로써 대략(大略)만을 가르쳐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분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보리열반과 진묘여불성(眞妙如佛性)이 문득 현전(現前)하여 생처(生處)는 스스로 숙처(宿處)가 되고 숙처는 스스로 생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살펴본다면, 화두를 드는 것과 반조하는 두 가지의 공부에서 그 효험을 얻음이 어찌 깊고 얕음이 있겠는가.
옛 사람이 이와 같이 가르쳐 준 기연을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 말할 수는 없으나 모두 반조와 간화(看話)로서 차별상을 가지지 않았거늘, 오늘날의 학인들이 서로가 공격하여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이처럼 배워왔는가.
혹자는 본분화두에 따라서 여법(如法)히 참구하다가 조금 쉬워진 곳이 있으면 곧 만족하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조금 이로(理路)를 섭렵해보았다 하면 곧 이를 쓸어버리고자 하듯 발자취를 없애니, 이는 불조(佛祖)의 가르침 가운데 무한한 방편이 모두 의리(義理)에서 나와 진흙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 사람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큰 방편을 삼은 줄 알지 못함이니, 이러한 사람들은 냉담무위(冷淡無爲)의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는 자이다. 혹자는 반조의 법문으로써 여실히 참구하다가 조금이라도 응집된 기미가 있으면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여 다시금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기이한 생각을 가져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도리를 말하고 지견을 나타내니, 이는 납승가(衲僧伽)의 본분정령(本分正令)이 부처를 삶고 조사를 삶으며 뼈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쳐 거듭 거듭 모조리 명근(命根)을 끊어버리는 참 수단일 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문호(門戶)의 빛과 그림자를 잘못 알아서 구경(究竟)의 연락처로 삼은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하고서 방치한다면, 우리 부처님의 바른 종지가 거의 땅에 떨어질 것이니 애통하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침에 그대가 물은 바는 때에 맞게 힘써야 할일을 바로 알고서 물은 것이라 하겠다.
내 비록 얇은 지식으로 공부항 게 없으나 어떻게 한 마디 말로 분명한 것을 가려서 말류(末流)의 폐단과 고질병을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갈등하노라.
그러나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학인은 다만 활구(活句)를 참구할지언정 사구(死句)를 참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사구(死句)는 이로(理路)와 언로(言路)와 견문과 이해와 사상이 있기 때문이며, 활구(活句)는 이로(理路)와 언로(言路)와 재미와 모색이 없기 때문이다.
참선을 하는 도인이 반조와 간화를 막론하고 여실히 참구하면 마치 한 덩이의 불과 같아서 가까이 하면 얼굴을 태우게 됨과 같으리라.
도무지 불법의 지해(知解)를 붙일 곳이 없으리니 어느 겨를 에 화두니, 반조니, 같으니, 다르니 하는 허다한 것들을 논할 수 있겠는가. 다만 한 생각이 앞에 나타나 투철하게 관조하여 남음이 없으면 백천 법문과 무량한 묘의(妙意)를 구하지 않고서도 원만하게 얻어서 여실히 보고 여실히 행하여 여실히 써서 생사(生死)에 큰 자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오로지 모든 생각들이 여기에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한암대종사 지음, 홍신선 주해<할 !(喝)>에서 발췌-
'성인들 가르침 > 과거선사들 가르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봉선사법문] 청산(靑山)에 비가 개이니 (0) | 2019.07.11 |
|---|---|
| 한암선사 선문답21조(4) (0) | 2019.07.03 |
|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은 마치 거울과 같다. (0) | 2019.04.28 |
| 한암선사의 선문답 21조(2) (0) | 2019.04.24 |
| 한암선사의 선문답 21조(1) (0) | 2019.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