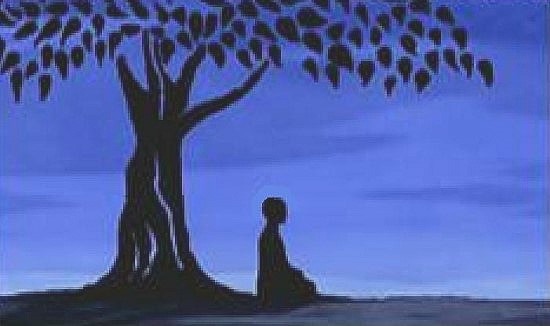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9. 3. 26. 10:20ㆍ성인들 가르침/화두선 산책
ㅇ.
스님 : 저는 ' 父母未生前本來面目' (네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원래 어떤 것 이었나?)화두를
드는데요
성철스님: 어떻게 안되드노?
스님 : 부모한테서 몸 받기 전에는 내가 과연 무엇이었던가를 잡고 있읍니다.
성철스님 : 내가 뭐였든가? 개였든가, 짐승이 었든가 사람이었던가? 허허!
그래 ' 父母未生前' 같은 것도,
그냥 "뭐였든가?" 이러는 것 보다도,
어떤 것이 너의 本來面目이냐 (如何是汝本來面目고)?" 이렇게 묻거든, 알겠어?
우리 六祖스님도 道明스님 보고 물었거든,
善도 생각하지 말고 惡도 생각하지 마라(不思善不思惡하라).
바로 이러한 때에(正與摩時에)
어떤 것이 너(明上座)의 本來面目인고?(如何是明上座의 本來面目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여.
本來面目(화두)가 거기서 시작됐고,
(그 뒤로) 예전 스님네가 더러 본래면목을 물었는데,
어떤 것이(如何是) 하는 이것이,
"어째서?"하는 것과 같은 식이라.
니 말하는 것은 좀 틀리는 것 같네? 니 뭐라 했노 금방?
스님 : 부모한테 몸 받기 전에는 나는 뭐였는가?--
성철스님 : "뭐 였는가?" 그것도 통하긴 통하는데,
그럼 소였든가 개 였든다? 이렇게 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냔 말이야.
알겠지 그 소리?
그러니 그렇게 하지마!
"그 뭐였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것이 나의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이냐?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어떤 것이"를 잊지말고.
-성철스님 화두수행법-
ㅇ.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ㅇ. 어떤 것이 나의 부모미생전 본래면목인가?
ㅇ. 내가 부모님에게서 잉태되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
ㅇ.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나?
ㅇ.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ㅇ. 내가 부모에게서 잉태되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나?
ㅇ. 내 부모가 태어나기 전, 나는 어떻게 있었나?
ㅇ.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ㅇ. 이것이 무엇인가?(이뭣꼬?)
ㅇ. 나는 누구인가?
ㅇ.
불교공부는 나를 깨닫는 공부인데 말을 따라 들어가면 가장 어렵고 뜻을 품고 있는 화두만 하나 잘 붙들고 들면 가장 간단하고 싶다.
하나의 뜻이 풀리면 팔만대장경이 다 살아나지만, 팔만대장경을 다 알아도 한 가지 뜻에 통달하지 못하면 만 가지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가 부처님 말을 해도 중생의 것이다. 헛짓이다.
부모미생전은 이 한 뜻을 품고 있는 화두이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단순한 문화 속에서 한마디인 '부모미생전'만 들으면 그냥 생각이 끊어지고 의심만 눈앞에 드러났다.
이 의심은 생각으로 짓는 의심이 아니고, 내가 부모로부터 나기 전에는 내가 알고 모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온 의심이었다. 이 의심 속에는 오직 알 수 없는 생명만 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실상을 놔두고 짓는 의심은 내가 만든 것이어서, 화두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이 주는 힘이 없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 형상을 끌고 다니는 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있다. 이 알 수 없는 실상이 곧 화두의 의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생긴 뒤에 온 것들이다.
보고 듣는 것, 돈, 학벌, 명예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다.
부모미생전이란 말은 이런 것들을 얻기 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모미생전' 화두 하나를 바로 통하면 이런 일체 것들을 일시에 놔 버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시 보는 눈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안이비설신의가 붙어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다.
이 몸에 붙은 육식(六識)이 밖을 나가 익혀 오욕 속에 뭍혀 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미생전'이란 말이 나에게 가깝게 닿지 않는다.
우리도 부모로부터 나왔고, 옛사람도 부모로부터 나왔다.
화두가 품고 있는 뜻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지만, 익힌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멀고 가까움이 생긴다.
옛사람 성품이 지금 나에게도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끄달려 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것에 급급하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패턴은 단순했다.
'부모가 낳기 전에' 하면 이 생명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없이 닿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하나가 눈앞에 드러나 석가모니가 깨친 경험을 그들도 한 것이다.
그리고 공자가 말하는 나의 성(性)이 스스로 있는 ' 하늘의 명(命), 곧 천명에 닿아 있다'는 말도 다시 살려 낸다.
모든 언어가 이 부모 미생전에서 살아나 버린다.
천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가 나기 전에도 태양은 돌고 있었고, 지구는 자전하고, 달이 뜨고 지고, 풀잎이 스스로 자라고 하는 것들이 다 천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 이 몸도 물을 마시면 오줌으로 나오고 피가 돌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천명을 안 떠나 있는 것을 본다. 다만 내가 그곳에 닿아 있지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의 성(性)은 그 천명 그 가운데 있다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알면 성품의 근본인 성(性)이 가깝게 다가온다.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천명과 내 성품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부처와 중생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석가세존은 이것을 깨달아 보고 나온 분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이는 만물을 치우치지 않는 눈으로 본다.
석가가 설한 중도설이 그것이다.
이 중도(中道)의 성질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부처라는 이름도 부모로부터 내가 난 뒤에 얻어 들어 아는 이름이다.
참말로 부처의 성질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선은 그 아는 것을 놓고 드는 문이다.
놔지는 곳에 알 수 없는 '이뭣고?'인 의심만 있다.
이 있지만 알 수 없는 것을 만나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것이다.
그것 하나를 바로 하면 모든 질서 없이 익힌 것들이 놓아져 실타래 풀리듯 질서가 나에게 다시 찾아든다.
팔정도의 싹이 튼다.
부모로부터 나기 전에 온 다른 언어를 '도(道)'라고 한다.
이 도는 무형으로 그림자가 없다.
이 도에서 하늘 땅이 생기고, 그것이 음양이다. 그리고 이 음양이 생긴 뒤에 오행이 생겨 나온 것이다.
마치 콩알 하나를 땅에 묻어 두면 두 떡잎이 나온 뒤 다섯 잎이 나오는 것과 같다.
음양이 일어난 뒤 별의별 것이 다 일어서 나온다.
너와 내가 있으면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과 같다.
형상이 없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홀로 있는 존재이다.
이 도는 머리로 알아드는 것이 아니다.
그를 가까이 하면 내가 변해 나온다. 그래서 머리로 알아 드는 것을 꺼린다.
이를 알고 들면 마치 덤불을 이고 드는 것과 같다. 곧 짐이 된다.
알고 드는 것이 스스로 있는 도를 가리기 때문이다.
'깨침'에 장애이다.
그런 '부모 미생전'은 그냥 말일 뿐 살아 있는 의심이라곤 없다.
알기 전엔 의심이 있지만 안 뒤에는 의심이 안 생긴다.
이 알기 전의 일은 그렇다.
'부모 미생전 ! 아, 내가 나기 전에 있는 나?'
나는 부모라는 인연을 지나 나왔지만 내 생명의 존재는 그들에게 예속된 것이 아닌 천명에 닿아 있는 것이다.
스스로 자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 몸은 그런 것이다. 이 몸은 스스로 있는 도가 바탕하고 있다. 몸이 하는 일이 슬기롭다.
이 몸은 스스로 있는 도가 바탕하고 있다. 몸이 하는 일은 슬기롭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몸은 육식(六識)이 밖을 나가 질서 없이 보고 들어 익힌 것으로 인(因)을 짓고 과(果)를 받아 윤회 속에 있는 몸이다. 이 윤회를 그치려고 불교의 갖은 이론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미생전 화두를 들면 그 태어난 뒤에 온 것들은 일시에 저절로 놔진다.
부모 미생전은 나무 끌텅을 보아, 뿌리 이전에는 아무 것도 없는 땅 속에 있는 그 무엇이다.
이 땅에 그 무엇이 나무라는 형상을 길러 주고 있지만, 그 땅에는 나무 같은 것이라곤 어떤 작은 형상도 찾아볼 수가 없다. 없지만 길러주고 있으니 묘하다.
이 묘한 성질이 곧 천명이고 나의 불성이다.
이것 하나만 바로 만나면 모든 종교가 주는 언어를 곧 바로 알아 헛것을 구해 우상을 짓는 마음이 그쳐 버린다.
<중용>의 '천명지위성'이라는 언어도 나에게 곧 닿는다. 이 몸이 슬기롭기만 하다.
'부모미생전'은 마치 계곡의 물이 한 곳으로 흘러 고여있는 호수와 같다.
모든 성인의 뜻을 이 부모미생전이 품고 있다.
하늘의 섭리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머물지 않는다. 그것이 불교의 성(性)이다.
유가의 천명, 곧 하늘의 명이 그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있는 곳에는 이 성(性)이 있다. 이 성이 나에게 있는 줄 알면 내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부모미생전'은 '음양이 생기기 전'이라는 말의 다른 언어이다.
부모로부터 몸 받아 나온 뒤에 익힌 상대적인 것들이 이 한 화두 공부에서 전체가 놓아진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미생전 화두이다.
다시, 화두는 살아있는 의심이다.
이 의심이 있는 곳에 이 몸은 '도'에 따른다.
그러면 틀리게 익혔던 것들이 나를 떠난다.
그리고 내 안의 능력이 눈을 뜬다.
예수가 말하는 '전지전능한 힘'이 그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 그 분이다.
모든 것이 통하고 풀린다는 의미이다. 얽힌 세상살이도 풀어지기 시작한다.
'부모미생전'에 있는 법을 보면 이 윤회 속에 있는 나가 없다.
도가 나가 되어 이 몸을 쓴다.
이 도의 성질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형상이 없고 이름이 없다. 그래서 '부처도 아니다'라고 한다.
부모 미생전은 부처의 눈을 달고 있다.
이 눈은 어디든지 같이 한다.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눈이 같이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상이 주는 몸 허물 속에서 부처를 본다.
왜냐하면 미생전은 몸이 아니어서 몸이 만든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허물을 걷어낼 필요가 없다. 되레 걷어내려는 그 마음이 허물을 더 만든다.
화두의 성질에는 허물 같은 것이 없다.
허물은 부모로부터 나온 뒤 형상인 몸에 집착된 것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미생전을 만나면 이런 것들은 일시에 사라진다. 작은 노력도 없이 사라진다.
부모미생전은 몸 속에 있으면서 몸이 아니고, 마음 속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니다.
어둠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다. 이 둘 이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는 이 경험을 그의 조상인 "아부라함이 낳기 전이다" 라는 말로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
그리고 공자는 스스로 돌고 있는 하늘의 명, 곧 천명이라는 말로 남긴다.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있는 이 명에 닿아 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내가 진리인 미생전을 만나면 이 세상이 다시 보인다.
천명에 닿아 있는 이 성의 텃밭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앉고 서고, 보고 듣고, 걸으나 서 있으나 도에 붙어 있는 나의 존재는 스스로 묘하다.
이 묘한 존재가 참나이다.
나는 편안하다.
이 묘한 "일구(一句)의 묘(妙)"가 눈앞에 드러나면 옛과 지금이 통하고, 너와 나 일체 성인에게 통하는 길이 열린다.
이 존재 앞에 선 내 눈앞에는 의심만 있다.
이 의심은 내가 만든 의심이 아니다.
내가 나를 놔지는 데서 온 의심이다.
옛사람은 이것을 두고 '일천(千) 성인도 모른다'라고 말한다.
양무제가 보리 달마를 앞에 두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라고 묻는다.
달마는 "불식(不識) ! " 이라고 답한다 의심을 보인 것이다.
혜가(慧可)에게는 " 이 일은 타인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혜가는 이 말에 눈을 뜬다.
의심의 성질은 이렇게 중생의 눈을 뜨게 한다.
다만 이 일은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얻으려는 목적이 없다.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아는 것을 놔두고 의심을 만나는 곳에서 이 나를 본다.
문헌에는 이 하나를 '나는 누구냐?'한다.
그러나 이 속 뜻에는 묻는 나가 없다.
알고 모르는 것을 놔두는 곳에 의심만 있다.
이 의심이 있는 곳에 생명이 숨쉬고 있다.
이 의심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
-중략-
우리는 들떠 있는 마음을 그치려고만 한다. 마음만 앞서 있다. 안된다.
이 속에서는 화두가 안된다. 생각이 만든 화두만 있다. 망상으로 짓는 이름인 생각의 화두이다.
그러나 이 몸이 작용하는 가운데에 상이 아닌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형상이 없다.
상을 의지해 상 아닌 것을 본다. 하려고만 하는 것도 상이다.
경허스님은 그 참선곡에 먼저 상을 말하고 나온다.
그 다음에는 상 아닌 것을 보게 하고 있다.
"앉고 서고 행주좌와와 어묵동정은 상이다.
그리고 뒤에 오는 '어떤 놈이고?'는 상 아닌 것이 그것이다.
"숨 떨어지면 송장인데 이것이 무엇인고?"
"홀연히 생각해보니 도시몽중에 상 아닌 것이 나에게 있다"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앉고,서고,보고,듣는 이놈은 무엇인고? 또한 그것이다.
"이놈 !" 할 때 '그놈!' 속에는 너,나가 없다.
홀로 남아 있는 알 수 없는 것만 있다.
'이 뭣고?'는 사람 속에 살아 있는 모습이 없는 생명인 싹의 언어이다.
기억하여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언어가 아니다.
이것을 곧장 바로 알아들으면 저절로 그침이 온다.
세상은 한가롭다.
내가 한가로우면 밖도 한가롭다. 대하는 것마다 공부가 된다.
-현웅 스님 저 <번뇌를 끊는 이야기> 운주사-
'성인들 가르침 > 화두선 산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뭣고' 참선수행법 법문 발췌 (0) | 2019.04.15 |
|---|---|
| 이뭣꼬?(이것이 무엇인가?) 화두 수행법 (0) | 2019.03.29 |
| 구멍없는 퉁수로 한 곡조 뽑아보고 (0) | 2018.08.06 |
| 얼굴을 남쪽으로 향해서 북극성을 보라(南面北斗) (0) | 2018.08.06 |
| 오는 것은 막지 말고, 가는 것은 잡지 말라. (0) | 201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