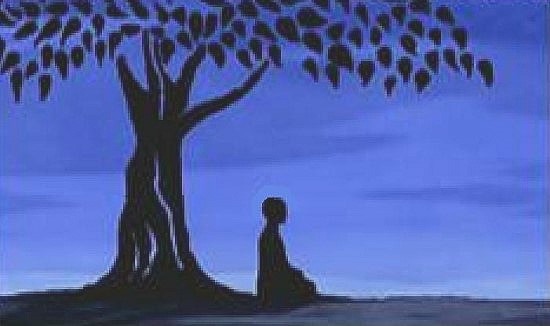2018. 7. 6. 09:54ㆍ성인들 가르침/기타 불교관련글
마음은 형상이 없어 불가득
부처라는 사람은 이 본래부터 있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 본래 마음은 깨달음의 성질을 품고 있으며 그 이름이 곧 불성이다.
부처는 이를 깨닫고 나서 세존이 되었으며, 세존께서 말씀하신 법문이 결집되어 경전이 된 것이다.
이 경전 중에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약인욕료지(若人欲了知) 삼세일체불(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應觀法界性)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마음을 알면 모든 성인을 한 곳에서 만난다.
모든 조사와 선지식들은 곧 이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 중 마조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다(卽心是佛)'라는 말로 다시 세존의 말을 살려내고 있다.
이 본마음은 깨닫는 사람이든 못 깨닫는 사람이든, 내가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항상 안 떠나고 있다.
이 마음은 성인에게 있는 것이나 범부에게 있는 것이나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다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존 또한 말한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은 쉴 새없이 활동하고 있으니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가 바쁘게 마음을 쓰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텅 비어 있으니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항상 쓰고 있으니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의 마음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아함경>
이걸 경험하면 우리들의 헛생각은 저절로 놓아진다.
선에서 말하는 사량분별이 저절로 그친다.
대개 참선이 잘 안되는 것은 이 얻을 수 없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시작한 데서 온다.
만약에 얻어지는 것이라면 마음이 아니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얻은 것은 잃는다.
생한 것은 멸한다.
만남은 헤어짐을 저절로 기약한 것과 같다.
오감이 사물을 만나 만들어진 마음은 그런 것이다.
참선 공부는 이런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아는 데서 시작한다.
변하는 마음에 내가 의지해 있으면 항상 나는 번거로움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 마음을 그치려고 선심(禪心)인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고 하는 화두를 든다.
다시 기억되는 것은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은 그 성질이 뿌리가 없이 떠도는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을 실재하는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없애고 안정을 얻으려고만 한다.
그러나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번뇌를 만들고 있다.
마음을 조용히 하려고 할 뿐 조용함은 오지 않는다.
오직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알 때라야 마음이 놓아져 조용해진다.
마음이 마음 아닌 것을 자각 속에서 알고 있을 때 본성이 드러난다.
이 본성의 성질은 비어 있다. 그리고 어떤 형상도 없다.
빈 마음은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곧 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이 빈 마음을 만나면 저절로 무너진다.
마음은 조용하다. 대개 우리는 '경이 어떻고, 어떤 법문이 그렇고' 등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불법으로 믿고 있다. 생각 속에선 맞다. 그러나 마음엔 그런 것이 없으니 어쩌랴 !
아는 불교를 붙들고 있는 동안은 내게 있는 불(佛)이 싹트지 않는다.
그 아는 불교가 빈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이다.
빈 마음은 어떤 법도 서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한다.
이 마음은 기억하는 성질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기억된 불교를 놓아 버려야 이 말이 믿어진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
사실 마음이 있는 줄만 알아도 편해진다.
먼저 믿음이 귀하다. 본마음에는 구하는 것이 그쳐 있다.
지혜가 있다. 이것이 확인되면 모든 방향은 끝난다.
밖으로 찾아나가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두름이 없어진다.
뒤바뀐 전도몽상이 바로 잡아져 생활에 질서가 생긴다.
불교이거나 불교가 아니거나 상관없이 내가 익혀 배운 것이 다 놔진다.
모든 상식이 저절로 놔진다.
생각이 순리를 따른다. 급한 성격도 고르게 되어 부드러워진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배움의 학교가 되고 상식 속에서 공부가 된다.
사람들은 본시 자기에게 있는 마음을 놔두고 배워 익힌 것으로 불교를 삼는다.
시끄럽다. 불교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종교이다.
따로 마음을 찾아 나서는 일을 그쳐야 한다.
찾아 나서면 머리만 뜨겁고, 그치면 머리가 시원하다.
보리 달마는 말한다. 찾는 것은 고통이다.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알면 찾는 마음은 그치고 내 안에서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이 저절로 살아 나온다.
마음은 집중을 안 갖고 있거늘
대개 사람들은 정신을 집중하는 것으로 마음을 알려고 든다.
이 마음도 놓아야 한다.
놓지 못하면 그 마음이 다툼을 만들고 본마음을 더 가려 버린다.
다만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알아야 한다. 알면 놓아진다. 나는 다시 평온하다.
너, 나가 살아나는 곳이다. 부처가 계신 곳이다.
좁은 나를 놔 버리는 곳에 큰 나가 있다. 부처가 있다.
불교는 넓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 종교이다.
우리는 마음이 아닌 불교를 믿는 것인가 돌아봐야 한다.
마음을 떠난 불교는 없으며, 있다고 해도 그것은 세존인 석가불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는 작은 것과 큰 것, 악과 선, 중생과 부자, 이 두 짝을 놔 버리면 어디서든지 하나로 뚫어져 있는 마음을 만난다. 이 마음 바탕을 성(性)이라고 한다.
이 성(性) 속에 부처가 숨 쉬고 있다.
부처는 우리가 지닌 이 성을 보고 말을 하고, 이 성엔 지혜와 복덕이 그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설한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귀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밖을 향한다. 동쪽과 서쪽에서 밖을 향하여 두리번거린다.
찾는 것을 그칠 줄을 모른다. 무심(無心)을 모른다.
무심이란 어느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이다.
빈 마음이 그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형상이 없는 것이어서 볼 수가 없다.
푸른 하늘의 허공과 같다. 허공은 지나가는 구름을 놔둔다.
구름에 머문 사람은 이 빈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성(性)을 모른다.
성을 보아 아는 사람은 구름을 놔둔다. 그러므로 구름에 머물지 않는다.
이 머물지 않는 마음을 조주는 "부처 없는 곳에서는 머물지 말고, 부처 있는 곳에서는 지나가 버려라"라고 말한 것이다.
'지나간다'는 것은 알고는 있되 그냥 놔두고 있다. 깨어있음의 다른 말이다.
이 사람은 마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알고는 있다.
경험이 온 자는 알고는 있지만 기억하여 지키지 않는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다.
그는 짐이 없다.
예수 또한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어라 !
우리는 누구나 이 성(性)을 만나면 지절로 무거운 짐이 내려놔진다.
집착이 사라지는 다른 말이다. 그가 말한 가난한 마음은 곧 빈 마음이다.
빈 마음을 만난 무거운 짐은 붙어 있을 곳이 없어 스스로 무너진다.
부처 없는 곳에서 머물지 말라는 조주의 말은 중생심인 탐,진,치에 머물지 말라는 말이다.
<금강경>에 있는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조주는 하나의 뜻에 다른 말을 내놓고 있는 것뿐이다.
이 머물지 않는 마음엔 차제(次第)가 없다.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가며 닦는 법이 없다.
'공부를 얼마나 했다'느니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다.
구름 걷히면 있는 하늘이 스스로 드러나니 말이다.
-현웅 스님 저 < 번뇌를 끊는 이야기> (운주사)-
'성인들 가르침 > 기타 불교관련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간명상서적 잠깐 들여다 보기] 알을 품고 있는 닭은 때를 안다. (0) | 2018.07.09 |
|---|---|
| 한때의 기쁨과 체험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0) | 2018.07.06 |
| [신간불교명상서적 얼뜬 들여다 보기] 번뇌를 끊는 이야기(1) (0) | 2018.06.29 |
| 언론사 불자 연합회,한국교수불자연합회 공동성명서 (0) | 2018.06.13 |
| 선가귀감(83) (0) | 2018.06.06 |